<앵커>
오늘(7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에 무더위 쉼터를 4만곳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노유진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어디냐고 묻자 직원은 민원실 의자가 쉼터라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어디서 쉬는 거예요?) 오시면 저기 앉아서 쉬었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주민은 잘 모릅니다.
[주민 : 동사무소(주민센터) 매일 갔는데, 그거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무더위 쉼턴지 알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구불 구불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쪽방 쉼터라고 지정된 교회가 나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무더위 쉼터를 알리는 간판조차 없습니다.
[이의학/주변 상인 : 아 여기 교회? 이게 뭐 무더위 쉼터예요?]
곰팡이가 뒤덮여 들어 가기힘든 곳도 있습니다.
[쪽방 무더위 쉼터 관계자 : 리모델링을 했는데 누수가 좀 있어요.]
서울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는 3천 3백 91곳.
1년 유지보수 비용은 한 곳당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쉼터가 될 리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약자만이라도 폭염을 피할 제대로 된 쉼터 정책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쉴 곳 없는 '무더위 쉼터' 4만 곳…허술한 운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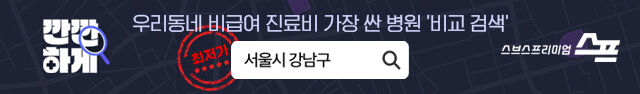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