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력설에 밀려서 그냥 휴일 취급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설은 가장 큰 민족명절입니다. 지난 시절 설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때로 한 번 돌아가 보시지요.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61년 설날의 한 가정집, 20여 명이 한복을 곱게 입고 두 줄로 늘어서서 어르신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다음은 색동 설빔을 입은 아이들 차례.
당시 설엔 한 가족이 모이면 방이 가득 찼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날을 큰 명절로 여기고 반겨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설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설빔을 장만해 입었고,
[극장은 명절의 관람객들로 들끓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연휴를 맞아 극장 나들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점은 물건 사는 사람들로 북적댔으며…]
설 준비를 하는 주부들로 시장은 간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연말 연초에 걸쳐 시중의 물가가 약간 오르게 되자…]
대목이 되면 어김없이 물가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양력설에 밀려 구정이나 민속의 날로 불렸던 설은 1989년이 되어서야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설날이 92년 만에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때부터 역에는 귀성 전쟁이 벌어졌고, 나아진 살림살이에 좀 더 분주한 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설 명절, 시대는 달라져도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정을 나누는 풍경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색동 설빔 입고 세배…설날의 추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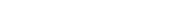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