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밤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호건 기자 나와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공장 폐수 같은 게 하천에 유입된 것도 아닌데, 물고기들이 잇따라 집단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만 왔다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렸던 지난 12일 서울 안양천 하류 염창교 부근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몸이 뒤집힌 채 떠다닙니다.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겁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불광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붕어가 둥둥 떠내려가고, 마대 자루에는 하천에서 건져낸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같은 날 당현천에서도 물고기들이 죽은 채 줄줄이 떠올랐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고일/서울 응암동 : 고기들이 몰살당했어. 싹쓸이 당한 거지.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다 떠내려갔어. 다 죽어가지고.]
모두 소나기가 온 직후였는데요, 은평구나 노원구, 강서구 같은 각 하천의 관할 구청들은 물고기 사체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수거작업을 벌였습니다.
---
<앵커>
이렇게 장소에 상관없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 뭔가 공통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그 이유는 생활 오수가 하천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하천 양 옆에 하수관로에서 오수가 넘친 겁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천 양 옆에 있는 하수관로입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하수관로는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활오수와 빗물이 모여 물 재생센터, 즉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엔 좀 다릅니다.
하수관이 수용할 수 있는 빗물이 시간당 1.75mm 밖에 되지 않아서, 이보다 비가 많이 오면 생활오수와 빗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아예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가 넘쳐도 빗물에 중화되지만,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다 말면 오염된 물이 하천에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결국 하천까지 오염되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게 되는 거죠.
---
<앵커>
그렇다면 오수와 우수, 그러니까 빗물하고 생활하수가 따로 따로 흘러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거 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빗물과 오수가 따로 흐르도록 설계한 목동 안양천 같은 곳은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 시내 설치된 하수관로는 무려 1만 300km에 달합니다.
전체 86%의 하수관에 하수와 빗물이 함께 흘러가는데요.
이 하수관을 모두 오수 전용과 빗물 전용으로 분리하려면, 공사 기간도 수십 년 걸릴 뿐더러 무려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이 빗물과 하수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완충시설입니다.
각 하수관로에 완충시설을 설치해서 빗물과 하수를 함께 모았다가 오염 물질을 거른 뒤 하천에 방류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완충시설도 비용은 많이 듭니다.
가장 저렴한 게 한 곳당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계속 모른채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오수가 지금처럼 하천으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비만 왔다하면 물고기 떼죽음, 대체 왜?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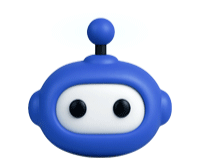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