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프로야구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전에도 야구는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고교야구 대회가 열린 동대문야구장에는 늘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자신이 졸업한, 혹은 자신의 연고 지역 고교를 응원하는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고교야구뿐 아니라 실업야구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은행 팀과 공기업 팀들이 참가한 실업야구는 당시 국내 성인야구의 근간이었다. 실업야구도 1960년대 초반, 페넌트레이스가 도입됐다. 실업야구가 틀을 갖추고, 대중의 관심을 얻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당시 실업야구 관련 자료를 지금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김응룡 전 삼성 사장과 김성근 고양원더스 감독 등 성공한 프로야구 1세대 지도자들도 실업야구 선수로 뛰었다. 당시 김응룡 사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포였다. 김성근 감독은 부상으로 일찌감치 은퇴했지만 남다른 노력과 근성으로 야구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기자가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1960년대 실업야구의 과거를 찾아 보기로 결심한 것은 김응룡 사장과 김성근 감독의 현역시절에 대한 호기심이 그 시작이었다.
1960년대 실업야구를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취재원이 절실했다. 기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은 박영길 전 롯데 감독(사진)이었다. 롯데 자이언츠 초대 감독을 거쳐 삼성, 태평양 등에서 감독을 지낸 박영길 감독은 1960~70년대 실업야구 최고의 좌타자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그의 야구인생은 실업야구의 역사와 괘를 같이 했다.
박영길 감독이라면 초창기 실업야구, 그리고 김응룡 사장이나 김성근 감독의 현역시절을 생생하게 들려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김성근 감독 역시 “박 감독은 똑똑해서 옛날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박영길 감독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김성근 감독의 말처럼 박 감독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들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들려주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SBS ESPN 뉴스는 박영길 감독을 통해 그와, 김응룡 사장,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현역 시절 이야기를 시리즈로 싣는다. 첫 순서로 ‘실업야구의 중흥기’편이다. [편집자주]
-한국 실업야구가 본격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영길 감독(이하 박 감독) :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우선 1956년에 한국일보가 주관해 재일동포학생야구단이 처음 한국을 찾았어. 우리나라 고교팀들과 경기를 치렀는데, 당시 장훈 선생, 김성근 감독 등이 선수로 왔었어. 그 당시 김성근 감독과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재일동포야구단이 매년 방문한데 이어 1961년에는 일본 실업팀이 한국 방문 경기를 하면서 국내 야구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해. 일본의 선진 야구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사실 50년대까지만해도 국내 투수들이 던지던 공은 직구와 커브가 전부야. 그런데 재일동포 선수들이 처음 보는 공을 던지더라고. 한국 실업야구에 진출한 재일동포 김영덕(전 빙그레 감독)씨가 슬라이더라는 공을 던졌어. 나는 좌타자라서 쉽게 당하지 않았지만 우타자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공에 ‘어~어~’하다가 그냥 다 헛스윙하거나 빗맞아 아웃됐지. 또 다른 재일동포 신용균(전 삼성 감독)씨도 싱커를 던졌는데 그 역시 생소한 공이었지. 결국에는 국내 투수들도 슬라이더와 싱커를 조금씩 익히게 됐어. 재일동포 선수들의 영향이야.
-재일동포 선수들이 한국야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준 셈이군요.
박 감독 : 그렇다고 봐. 이들이 당시 실업야구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용병같은 존재였어. 한국프로야구가 용병제 도입 후 조금씩 선진화 된 것처럼, 1960년대 실업야구에도 일본에서 운동을 했던 재일동포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
-재일동포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에서도 맹활약했죠?
박 감독 : 맞아. 당시 2년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라는 것이 있었어. 대만과 필리핀은 전력이 조금 떨어지고 한국과 일본이 우승을 다퉜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더 강했어. 아시아선수권대회 한일전은 국내 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지. 그런데 1963년 제 5회 대회에서 우리가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한거야. 전국적으로 대단한 뉴스거리였어. 반일감정이 아주 강하던 때였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관으로 대표팀을 초청할 정도였지. 그때 우리 대표팀 타선은 나를 비롯해 김응룡, 박현식(작고) 씨등 국내파들이 주도했지만 마운드는 재일동포인 신용균씨가 이끌었어.
-실업야구가 활성화된 다른 요인도 있었겠죠?
박 감독 : 1964년부터 한국 실업야구도 페넌트레이스 제도를 도입하게 됐어, 그 이전까지는 토너먼트 형식이었지. 당시 실업야구 규모가 크게 팽창됐어. 대다수 은행들이 야구단을 창단했고, 이밖에 서울시청, 인천시청, 철도청, 체신부, 한국전력 등도 팀을 만들었지. 그 당시에는 워낙 팀이 새로 창단했다가 또 금방 사라지곤 해서 정확하게 몇 개 팀이 있었는지 따지는 건 무의미 해. 아무튼 1964년 페넌트레이스가 도입될 당시 13팀이 있었어. 13팀이 봄리그, 여름리그, 가을리그로 나눠서 리그당 팀 간 1게임, 총 12게임을 치른 뒤에 최고 승률팀을 가렸어. 나중에는 전,후기 리그로 나눠서 코리언시리즈를 열기도 했지.
-페넌트레이스 도입 후와 그 이전을 비교할 때 환경적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뭔가요?
페넌트레이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업야구 선수들이 야구와 회사 업무를 모두 소화했어. 보통 대회 한 달 전부터 합숙을 하고 대회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사무를 보는 식이었지. 그러나 페넌트레이스가 도입된 후로 회사 업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어. 경기 나가고, 훈련하고, 또 경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야구에만 전념하면서 실력도 점차 늘어났지.

박 감독 : 대부분 그렇지. 그런데 동대문야구장, 하나를 두고 아마추어와 나눠서 써야했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열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 하루에 시간을 나눠서 3경기씩을 했고 그래도 부족하면 용산에 있는 육군야구장이나, 수유리에 있던 상업은행 야구장, 연신내에 있던 농협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열기도 했어.
-그럼 이제부터 감독님 이야기를 해보죠. 1960년 2월에 경남고를 졸업하셨는데 대학 대신 곧바로 실업팀을 선택하셨죠?
박 감독 : 그렇지. 부산에 본사를 둔 남선전기 팀에 입단했어. 당시 김응룡, 유백만(전 MBC청룡 감독)이 모두 남전 멤버였어. 1960년에는 실업팀이 남전 외에 농업은행(농협 전신)과 한국운수 등 3팀 뿐이었어. 사실은 김응룡이나 나나 당시 최강팀인 농업은행에 가고 싶었지만 잘 안됐지. 그래서 결국 남전을 택하게 된 거야. 대표팀을 제외하고 내가 김응룡과 한솥밥을 먹은 유일한 시간이었지.
-남전 생활은 그리 길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 감독 : 남전 입단하고 1년 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영향으로 남전 팀이 해체됐지. 어쩔 수 없이 나와 김응룡을 포함해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 나는 고민하다가 동아대학교에 가기로 했어. 요즘있는 특기생이 아니라, 시험 봐서 정식으로 입학한거야. [2부에 계속]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정진구 기자)
![[박영길의 야구역사] (1)실업야구의 중흥기](https://img.sbs.co.kr/newsnet/espn/upload/2012/06/18/30000083105_1280.jpg)


![[단독] "한국, 투자 의지 없는 듯"…미국, 돌연 꺼낸 요구](http://img.sbs.co.kr/newimg/news/20260203/20215340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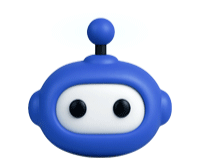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