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이 5시간에 걸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전소에 이른 것은 한 건 문화재가 소방관련 법령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문화재청 찾아라, 파괴할까요 말까요, 기왓장 뜯으니 안에 또 기왓장" 등 다급한 대화만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법령의 미비"라며 "소방법령에 문화재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소방관들의 현장 훈련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는 `문화재'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각종 건물은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방화(防火) 관리자를 따로 선임해 화재를 막도록 규정돼 있고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의무도 명시돼 있지만 문화재는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예방팀 관계자는 "소방법령이 말하는 건물은 일반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문화재는 아니다"며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문화재에 불을 지른 이에 대한 처벌만 형법을 참고하라고 짧게 언급돼 있을 뿐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이처럼 문화재에 관한 소방 법령이 전무하고 그에 따라 별도로 구체화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에 타는 숭례문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와 대원들이 모두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으나 `국보 1호'라는 부담을 느꼈고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전교신 내용에는 `문화재청 관계자 찾아라', `파괴할까요 말까요' 등 다급한 말들이 여러 차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왓장을 뜯어냈는데 그 안에 석회가 있고 또 기왓장이 있더라'고 하는 등의 말을 소방관들이 주고받았다"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훈련도 부실했고 숭례문의 구조 자체를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무전교신을 분석한 결과 일단 현장 소방관들은 불을 끄고 동시에 문화재도 보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업무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오판 등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이 문화재 화재 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진화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주요 문화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도록 한 법령의 맹점이 무엇보다 아쉽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소방 지휘관의 결단력 부족이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자다가 "안 먹어" 울부짖은 아이…어린이집 CCTV 봤더니](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5/20214415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김병기,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했다"…커지는 의혹](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5/20214413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CCTV 없다" 사건 종결됐는데…식당은 "경찰 안 왔어요"](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5/202144142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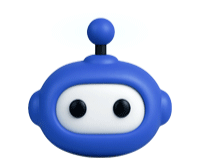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