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국내 개봉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저는 취재차 베니스에 갔을 때 현장에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일반 기사들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내용을 재편집해 이번 비엔날레에 출품했다는데, 저는 부산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작품을 접하게 됐습니다.
‘위로공단’은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와 과거 영상, 그리고 감독이 만들어낸 실험적 이미지가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95분짜리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입니다. 감독은 이 작품을 위해 모두 65명을 인터뷰했고, 이 가운데 여성 21명과 남성 1명, 그렇게 모두 22명의 인터뷰를 골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많이 알려졌듯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그래서 60-70년대 구로공단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수출 증대를 목표로 내걸고 정부가 구로에 조성한 대형 공장 단지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10대 소녀들이 돈을 벌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쉴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소녀들은 잠을 쫓아가며 야간 근무에 내몰렸고, 쉴 때면 여러 명이 나눠 쓰는 합숙소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소녀들은 남의 집 식모로, 만원버스 차장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 급속한 산업화의 그늘을 잘 담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감독은 이 문제를 ‘오늘 이 곳’으로 가져옵니다. 60~70년대 구로공단 봉제공장의 많던 여공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노동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대형마트와 콜센터 여직원, 여승무원 등 서비스 업종 감정노동자들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도심 외곽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공간상으로도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은 국경을 넘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됩니다. 영화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현지 군경이 총칼로 유혈진압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사건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인터뷰합니다.
지친 그녀들의 얼굴 위로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 꿈을 포기한 채 공장으로 내몰려야 했던 60-70년대 한국 소녀들의 얼굴이 겹쳐집니다. 그 많던 여공들이 사라지고, 식모도, 버스 차장도 더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30-40년 전 한국 소녀들의 삶은 오늘날 저개발 국가 여성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에 그대로 반영돼 있고,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며 일하는 이 땅 여성들의 고된 삶 속에서도 또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위로공단'은 그 파편적인 현실들을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영화라고 하기엔 미학적 표현들이 넘쳐나고 미술작품이라고 부르기엔 내러티브가 단단하고 친절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큰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보실 만합니다. 개봉하면, 이 작품이 현대미술계 거장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취재파일]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지 마라…임흥순의 '위로공단'](https://img.sbs.co.kr/newimg/news/20150515/200836956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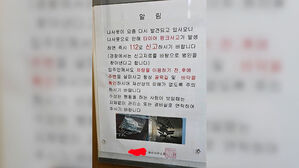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