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마음은 급한데 의사가 달려오지 않아서 애태워본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없어서 운영난에 시달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47곳의 응급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뉴스인 뉴스에서 윤나라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단 하나뿐인 응급실이 폐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해마다 2억 원가량 적자를 보면서도 버텨왔지만 올 들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원금이 삭감된 건 경력 있는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성호/강화병원장 : 인력 기준을 못 맞춰 복지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지역 병원은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경우가(생기죠.)]
이곳이 문을 닫으면 응급 환자들은 인천이나 김포까지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도 차로 40분이 걸립니다.
인구 6만인 이곳 가평에는 응급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30분 거리인 구리나 춘천까지 가야 합니다.
[김희원/경기도 가평 주민 : 몇 시간 지체가 되면 살릴 사람도 못 살릴 수 있지.]
전국의 응급실은 5년 새 47곳 줄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가 적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시골 응급실은 월 1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의료인력이라든지 간호인력을 상시 (지원하고) 인상된 수가를 적용해줘서 적자 폭을 줄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었고 인위적으로 간호사를 배치하기도 어려워 지방 주민들의 응급 의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신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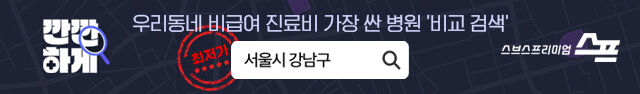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