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전부터 안 의사는 일제의 특별 경계 대상이었죠. 일제의 사형집행명령서엔 안 의사를 독방에 구금하고, 간수를 늘려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법원에 출정할 때는 압송마차를 따로 준비해 외부에 노출되는 걸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뒤 예정했던 사형집행일도 연기했습니다. 순종 황제의 생일인 3월 25일 사형을 집행할 경우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일제는 안 의사의 죽음이 항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일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누락했을 거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제는 애초부터 안 의사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옥법까지 어겨가며 안 의사 시신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렸던 거죠. 행여 안 의사의 유해가 항일 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안 의사의 시신 매장 과정도 의도적으로 상술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소노끼 보고서에서 남은 유해발굴 단서는 '감옥서의 묘지'만 남았습니다. 소노키 보고서 외에 안 의사의 사형집행 소식을 전한 당시 일본 매체들은 안 의사의 매장지를 '공동묘지', 뤼순감옥묘지', '감옥공동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안 의사 유해발굴의 핵심은 '(뤼순)감옥(서) (공동)묘지'가 어디냐는 걸 찾는 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안 의사 유해 매장지 관련해선 도쿄 매장설, 이토 히로부미 무덤 옆 매장설, 하얼빈 공원 매장설, 수장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 의사 유해발굴 과정 중단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썰'에 불과하다는 게 유해 발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각각의 설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때문에 일제가 남긴 문서에 근거한 뤼순감옥 공동묘지 매장, 당시 명칭으론 '관동도독부 감옥서 공동묘지'에 유해 발굴 조사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뤼순감옥 주변에도 묘지로 쓰였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었고, 안중근 의사 유해 지점을 정확히 특정할 사료가 부족한 점이 안 의사의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후손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파일 - 안중근 유해 찾기 키워드]
▶ ① - '감옥서의 묘지'가 어딘가?
▶ ② - 주목해야 할 '둥산포' 묘지
▶ ③ - 최후 형무소장 '타고지로'의 악행
▶ ④ - "안중근 의사는 침관에 누워 계신다"
▶ ⑤ - "어렵고 힘들다"는 건 국민도 다 압니다
▶ ⑥ - 안중근 기념관은 돌아오는데…
▶ ⑦ - 사라진 안 의사 가족의 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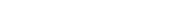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취재파일] 안중근 유해 찾기 키워드 ① - '감옥서의 묘지'가 어딘가?](http://img.sbs.co.kr/newimg/news/20180703/201201523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