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부, 그러니까 국민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2경 4천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3%, 1천217조 원 늘었습니다.
국민 순자산은 정부, 기업, 가계, 은행처럼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의 빚을 뺀 값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경제가 가진 순수한 부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불어난 1천217조 원, 국민 순자산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비금융자산에서 635조 원, 순금융자산에서 582조 원 각각 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증가 폭이 2023년에는 300조 원이 안 됐거든요. 1년 만에 꽤 많이 늘어난 건데,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국민 순자산 증가율이 불과 1년 만에 1.3%에서 5.3%로 늘었는데요.
집값과 미국 주식이 오른 덕에 자산 가격이 늘면서 국부 증가에 900조 원을 기여했습니다.
지난 국민 순자산 증가는 거래 외 요인이 908조 원, 거래 요인이 303조 원에 달했습니다.
거래 외 요인이 거래 요인의 3배에 달하죠.
거래 요인은 자산 순취득을 의미하고, 거래 외 요인은 그 외인 자산 취득에 연관되지 않은 시장 가격 상승, 자산 가격 변동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부 증가의 4분의 3이 거래 외 요인인 셈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실제로 사서 부를 취득한 것보다, 그게 값이 올라서 부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의 명목 보유 손익이 352조 원 급증하면서 1년 전 마이너스 67조 원의 감소세를 벗어났습니다.
특히 토지 가격이 1년 전에는 2%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1.2% 올랐습니다.
지난해 주택 시총의 경우 7천조 원이 넘어서 전 년보다 4.2% 증가했는데, 주택 시가총액이 증가한 건 3년 만입니다.
수도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수도권 기여율이 90.6%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해 생각해 보면 환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해외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결국 금융자산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해 사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뚜렷했습니다.
순금융자산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서 582조 원 증가했는데요.
금융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크게 늘어서 전년 대비 56%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금융자산에서 해외 주식 등 금융자산 순취득도 증가 폭이 43조에서 117조 원으로 컸지만, 거래 외 요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순금융자산이 급증한 영향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19조 원이었던 게 무려 465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S&P500 지수는 23.3% 증가했고, 환율은 연말까지 1천480원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제 1인당 가계의 순자산은 일본을 넘어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번에도 2억 5천만 원 수준을 넘어섰네요.
<기자>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천251만 원으로 1년 새 3.3% 늘어났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가계 순자산은 1인당 27만 1천 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일본과 영국보다 많은 규모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국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앞서고 있습니다.
가계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절반이 넘는 50.9%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도 역시 부동산으로 주택 외 부동산이 23.7%고요, 현금 예금이 19.4%, 보험 연금이 12.1%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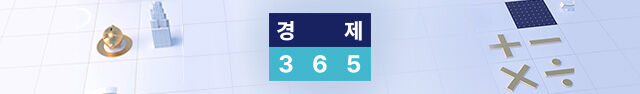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