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도마일기2 - 꽃다운 날들
한때 복사꽃이 만발하였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도마마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그 마을에서 늙어가는 여인이 있다. 도마마을의 최고령자인 90살 한두이. 지리산 자락에서 밭일하던 젊은 날은 갔다. 한 걸음 떼기도 숨이 차는 그녀에겐 이제 반 평짜리 마루가 세상 전부다.
"사람들 막 고사리 끊으러 가재. 막 밭에 가재. 나 여기 앉아서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욕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보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도마마을 가운데에 자리한 초록 대문 집에 사는 그녀. 그녀는 늘 마루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고, 낮과 밤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두이의 하루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녀가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
● 더 늙은 여자와 덜 늙은 여자의 미묘한 신경전
거동이 불편한 두이의 집에 병간호를 위해 세 딸이 돌아가면서 머문다. 세 딸 중 두이를 가장 살뜰히 보살피는 건 첫째 딸인 엄계순(70).
엄마와 딸은 서로의 삶을 연민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된다. 어렸을 때와 뒤바뀐 부모와 자식 사이. 어린 딸은 자라서 늙은 엄마의 보호자가 됐다.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던 여름, 된장독이 터져버렸다. 된장이 잘못될까 애가 타는 엄마 두이와 노모 대신 갖은 노동을 하느라 지친 딸 계순. 깨진 된장독을 둘러싼 모녀간의 긴장감은 고조되는데. 모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자꾸 엉뚱한 소리해서 내가 짜증이 나니까."
● 효, 책임과 의무의 줄다리기
두이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일곱 자식을 먹이려 밭일을 하다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고통을 참아냈다. 어린 자식이 아프면 겁도 없이 호랑이가 나오는 산길을 홀로 넘어 약을 구해오기도 했다. 자식들도 엄마의 고생을 충분히 안다.
벌초를 위해 오랜만에 두이의 집으로 모인 자식들. 이야기꽃이 어린 날 엄마에서 현재의 엄마로 이어진다. 아픈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늙은 부모에 대한 형제간의 진담이 오간다.
"오늘도 안 오려나보네. 딸들이 안 오면 나 혼자 살지 뭐. 여기는 내가 죽어야 나가지. 어디 갈 데가 있냐."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늙은 엄마를 병간호하느라 고생하는 자식들을 보는 두이의 마음은 편치 않다. 건강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자식들에게 미안해지니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가 두이의 말버릇이 됐다. 두이를 찾아오는 동년배인 동네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주요 화두는 바로 '죽음'. 죽음에 대한 그녀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끝을 기다리는 두이, 그녀의 방엔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음에 차지 않는 영정사진이다. 먼 곳으로 가는 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두이는 영정사진을 다시 찍으려 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제 나는 고마 죽으면 좋겠어. 아무 소원도 없고 죽어서 하늘로 가고 싶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깝고도 멀고, 단순하고도 어려운 관계. 그 관계 속에 얽혀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도마에서 태어나 이젠 마지막을 기다리는 한 여인, 한두이의 일기를 통해 '부모 그리고 나의 세월'을 들여다 봤다.
(SBS 뉴미디어부)
▶ "모든 것이 봄인데, 모두 일 하는데, 나만 종일 집안에"
▶ "정들만 하면 가고 그런다"…잠시 머무는 곳이 된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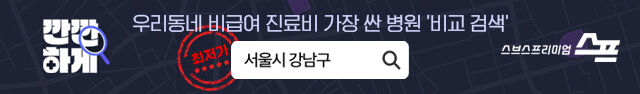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