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린 키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 키우듯 지극정성으로 7년을 키웠더니 이렇게 보답하네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17일 오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포도농원 한 쪽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탄성을 쏟아냈다.
약 1천㎡의 포도 재배 비닐하우스 옆으로 어른 팔뚝만 한 몸통의 키위나무가 가지를 펼쳐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막아 아파트 한 채만한 100㎡ 넓이의 그늘을 만들어 냈다.
입이 무성한 키위나무 그늘에는 가지마다 2∼7개의 키위 열매가 빼곡히 맺혀 익고 있었다.
"하나, 둘, 셋…2천500개는 되겠네."
주민들은 키위나무 한 그루에 수천개의 열매가 달리는 눈앞에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렵다는 듯 하나씩 열매 개수를 세어보다 열매가 너무 많아 한번 세었던 키위를 다시 세기를 반복하다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키위나무에는 통상 300∼500여 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나무에서 많이 맺혀야 1천여 개 내외가 맺힌다.
2천500여개의 열매가 한 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그만큼 특이한 일이다.
'폭염 탓에 열매가 많이 맺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포도농원 주인 홍청용(76)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홍씨는 "이렇게 무더위가 아니었지만, 지난해에도 이 나무에서 1천800여개 열매를 수확했다"며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요즘에는 밤에 나무들이 더운 날씨에 숨구멍을 닫아 생육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그가 키위나무를 심은 것은 지난 2009년께다.
오랫동안 포도농사를 지어온 홍씨는 포도와 비슷한 덩굴식물인 골드키위종 묘목을 사와 포도밭 옆에 심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꽃까지 피웠지만, 처음 4년 동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수나무인 탓이라는 주변인들의 말에 암나무 가지를 여러 개 접목해 봤으나 그중 하나만 성공했다.
수나무와 암나무가 합해진 키위나무는 무럭무럭 해마다 가지를 펼쳐 어느덧 100㎡ 넓이로 자라났다.
홍씨는 포도나무를 키우던 농사기법을 이용해 매해 가지가 자리 잡을 집을 넓혀 주고, 영양제와 거름을 듬뿍 주며 친환경으로 정성스럽게 나무를 키웠다.
평소 수확한 포도를 시장에 내놓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만 팔아도 동날 정도로 포도농사에 자신 있던 홍씨는 포도 키우던 노하우로 지극정성으로 키운 것이 도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는 "모든 농사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 열매를 수확한 시기 직후인 가을에 판가름난다"며 "열매를 맺느라 권투선수로 따지면 '그로기' 상태인 나무에 '감사 비료'를 듬뿍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키위는 다랫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식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1900년께 중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선교사가 다래 씨를 자국으로 가져간 뒤 종 개량을 거쳐 상품화돼 전 세계적인 과일이 됐다.
우리나라에 키위가 들어오면서 '참다래'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토산종 '다래'가 자칫 가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양다래'나 '키위'로 불러달라고 당부하곤 한다.
(연합뉴스)
"정성들여 키웠더니…" 한 그루에 2천500개 키위가 주렁주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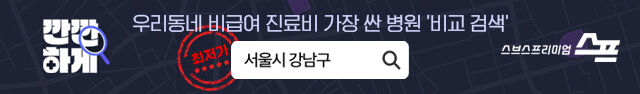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