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손님!”
여성 두 명이 주문을 받기에 바쁘다. 30대 중반은 돼 보인다. 라틴계다. 역시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도 감자튀김을 내오느라 동분서주다. 앞치마를 두른 10대 젊은 여성 직원도 있었다. 손님이 있건 없건 잠시나마 앉아 있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오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빅맥 보다는 조금 (40센트) 비싼 햄버거 세트다. 영수증을 보니 감자튀김에 탄산음료, 부가세까지 더해 8.34달러였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점심을 맥도널드로 ‘때웠다.’ 미국의 노동절이다. 5월 1일 메이데이의 기원은 따지고 보면 미국인데, 정작 미국은 다른 이유로 9월에 노동절을 지낸다. 노동절 날 점심을 먹기 위해 워싱턴 시내 맥도널드 매장으로 향한 건 지난주 금요일 뉴스 때문이다. 이날 미국의 맥도널드 직원들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섰다. 맥도널드 뿐 아니라 버거킹, 웬디스, KFC, 타코벨 등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덴버, 샌디에이고 -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60여개 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두 배 이상 15달러로 인상하라는 것, 둘째는 3백만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사측의 보복 없이 단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절을 앞두고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에 미국 언론들이 주목했다. 햄버거 크기에 빗댄 ‘슈퍼사이즈 임금 인상 요구’ 같은 표현을 붙여가며 경쟁적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급하게 아침뉴스부터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내용물이 부실한 ‘패스트뉴스’였던 터라 가슴에 얹혔고, 좀 더 곱씹어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현재 미국 연방 차원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데, 패스트푸드 업계는 바로 그 한계선에 있다. 주에 따라 7.25달러이거나 1~2달러 많은 수준이다. 정말로 한 시간을 꼬박 일해야 햄버거 세트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면 연간 15,000달러에서 18,0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맥도널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체 측의 얘기다. 사회초년병 10대들이 기술도 배우고 용돈도 버는데 무슨 불만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잘못된 진단이다. 우선 미국 경제 구조의 문제다. 햄버거 빵을 뒤집고 감자를 튀기는 건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용돈벌이가 아니다. 20대 후반의 가장, 30대 초반의 주부들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생업이다.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패스트푸드 매장의 이직률이 대폭 줄었다. 맥도널드에서 밥벌이를 하는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위기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소비자들이 대거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향했다. 10~20 달러에 팁까지 15~18% 얹어줘야 하는 웬만한 식당보다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들 역시 값이 싼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을 찾아 끼니를 해결했다.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 다른 직종들이 일자리를 줄일 때 패스트푸드 업계는 오히려 고용을 창출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저임의 ‘맥잡(McJob)’이었다.
일선의 매장 직원들이 빈곤선 밑에서 허덕일 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주들은 막대한 연봉과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CEO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을 묶고, 주주들은 그 성과를 인정해 CEO의 손에 고액의 연봉을 쥐어줬다. ‘맥도널드 매장 직원이 한 시간에 8.25달러를 벌 때 CEO는 연봉 875만 달러를 벌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는 탄탄한 취재에 근거해 두고두고 회자된다 (2012년 12월 12일). 기업들은 최저 임금을 동결하기 위한 로비에도 돈을 퍼부었다.
근로자들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근로 시간을 사측이 배정하는데, 주 40시간 풀타임 일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다. 파트타임이라도 매장 2곳을 오가며 수입을 올리면 좋은데, 그것도 아주 예외적이라고 한다. 근무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직영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이 많기 때문이다. 막대한 이익은 본사로 흘러 들어가는데, 노사 관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그 매장 직원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나 몰라라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으로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고용도 해고도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몫입니다.” 폴리티코가 전한 버거킹 대변인의 말이다. (2013년 8월 29일)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 임금으로 먹고살기 힘들다, 올려야 한다는 데는 미국민들 사이에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이 임금을 올리면 햄버거 값이 오르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고전경제학적 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햄버거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과연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진단, 미국 언론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맥도널드 본사의 순익은 55억 달러, 6조 원이 넘는다. 주주(shareholder)와 CEO가 가져가는 몫을 조금만 양보하면 수많은 직원들,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건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패스트푸드 경제는 2천억 달러, 2백조 원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도 산다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다.
50년 전인 1963년 워싱턴 대행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 앞에 모인 수많은 흑인들이 외친 건 민권(civil rights)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점을 지적하며,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로 외연 확장을 주문했다. 노동절을 맞아 한 신문이 토머스 페레스 노동부장관을 만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간격을 좁혀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맥잡(McJob)'으로 대표되는 소득 양극화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에 따라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식 경제 모델을 좇아 온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한 시간 일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있을까? 휴일인 노동절에도 “다음 손님!” 소리가 끊이질 않는 워싱턴의 맥도널드 매장에서 든 생각이다.
[월드리포트] 미국 노동절에 햄버거를 생각한다
![[월드리포트] 미국 노동절에 햄버거를 생각한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30904/200687875_1280.jpg)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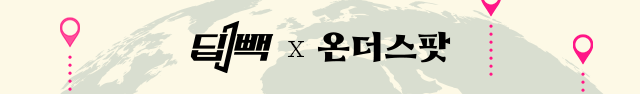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