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 씨는 지금 전기차를 설명할 때 '경제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처음엔 절약이었는데 나중엔 자부심이 생겨요. 미세먼지 심한 날엔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구나 싶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금이나 포인트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개인의 탄소가 돈이 되는 순간'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감축량을 시장에서 가격으로 환산하는 제도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연간 평균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순감축량은 약 0.7톤 수준이다.
11월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1만 원. 따라서 초기 환급액은 연 7천~1만 원 수준이다.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에 주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김마루 과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순감축량은 최대 2톤까지 가능하고, 배출권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업계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30년경 톤당 4~5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만약 순감축량이 2톤으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환급액은 최대 연 9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차이는 규제의 강도와 시장의 성숙도에서 나온다. 한국은 여전히 느슨한 배출권 할당과 낮은 수요로 가격이 억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감축 목표를 높이고 전력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시장 가격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은 그 첫 진입점이다.
보조금의 시대는 끝나고, '성과 보상'의 시대가 온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줄이기만 하지 않았다. 전기차 정책의 성격을 '구매 보조금'에서 운행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패러다임 이동이다. 돈을 주는 정책에서 탄소 절감량을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개인이 직접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행거리·충전량을 인증받고 배출권을 대신 거래하는 중개 플랫폼이 생겨난다. 플랫폼은 수천 명의 데이터를 모아 정부 인증을 받고 감축량을 인정받는다. 이후 거래 수익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개인에게 지급한다.

국내 전기차는 약 91만 대이고 이 중 개인 승용차는 약 73만 대다. 제도는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출범해 2027년 하반기에 첫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 말은 곧, 73만 명의 '탄소 경제 시민'이 탄생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인식 변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은 운전 습관이 아니라 국가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탄소는 환경의 언어에서 경제의 언어로 옮겨 간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단순한 유류세 문제가 아니었다. 기후 정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왜 지방 주민이 도시 권력의 정책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분노의 폭발이었다. 스웨덴은 탄소세로 가장 모범적인 감축을 보여줬지만, 2000년대 초 탄소세 인상 시기마다 지역 정당이 집권 교체를 경험했다. 기후 비용 분배가 선거 결과를 바꾸는 변수가 된 것이다. 뉴질랜드는 탄소배출권 배당 정책이 농업 정책·선거 공약과 연동되며 "배출권 수익의 더 많은 몫을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탄소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는 의제다. 한국이 앞으로 마주할 장면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제 한국도 그 문턱에 발을 들여놓는다. 전기차 배출권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탄소 감축은 그동안 기업의 의무, 정부의 목표, 국제회의의 숫자였지 개인의 경제 행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탄소는 개인의 수입 항목이 되고, 전기차는 감축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탄소가 정책 목표를 넘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전기차 정책이 환경 정책에서 경제 정책으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탄소 감축이 생활경제의 문턱을 넘어온 순간, 기후 정책은 더 이상 고상한 공익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경제·정치 변수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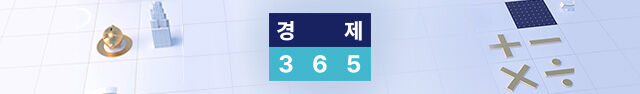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