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서울 아파트 산 사람 중에 30대가 가장 많다면서요?
<기자>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 중에 30대 비중이 36.7%로 10명 중의 4명에 달하는데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금리도 여전히 높고 대출 규제도 강해졌는데요.
그럼에도 30대가 다시 움직인 건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조건도 좀 더 유리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부의 정책 대출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지금 아니면 더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서둘러 집을 사려는 30대의 '패닉바잉', 또는 '영끌'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직장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강서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 46%, 성동구 45%, 은평·영등포·서대문·성북구도 모두 40%를 넘겼습니다.
거래된 집 두 채 중 한 채를 30대가 샀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10·15 대책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정책 자금과 갭투자 수요가 겹쳐진 결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자금 활용이 가능한 30대 매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금융사들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부실도 같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기자>
실제로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4대 금융지주에서 3분기 이익이 15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실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즉 고정이하여신 NPL 규모는 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아직 이자를 내고 있지만 언제 부실로 넘어갈지 모르는 '요주의 여신' 규모도 18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입니다.
반면에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 평균 'NPL 커버리지 비율'은 1년 새 18.5%포인트 떨어져서 123.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3분기까지 충당금을 5조 6천억 원 가까이 쌓았지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속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경기 둔화 때문만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 같은 취약 차주는 물론, 가계의 상환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의 수익은 커졌지만, 부실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은 금리 얘기네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진 모양이죠?
<기자>
제2금융권 중에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9월 초에 3% 안팎이었던 게 최근 2%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제는 3%대 상품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저축은행에 넣어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막상 가보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아져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 제2금융권이 예금 경쟁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관련 부실채권 정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F 대출은 분양 수익으로 돈을 갚는 구조인데,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이 실패해 연체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부실채권을 털어낸 결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월 말 8.37%에서 9월 말 6.78%로, 신협도 8.36%에서 7%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2금융권은 PF부실 여파로 기업 대출은 섣불리 내줄 수 없고,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도 줄이다 보니 수신을 확보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리면서 예금의 매력은 줄고, 자금은 점차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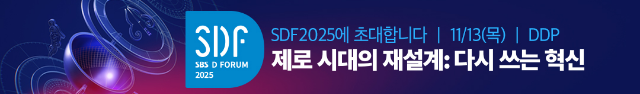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