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어제(29일) 오후 4시쯤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중학교 3학년 김 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김 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 군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김 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반포동 학원가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장소였지만, 아무런 단속이나 제지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은 "오후 5시쯤 되면 고등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많이 다닌다"라며 "골목 안에서부터 내리막길을 타며 쌩쌩 지나가 손님들이 부딪힐 뻔한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킥보드 없는 거리'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도 사정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거리 곳곳에 여러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어 인근에서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거리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임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지만 역시 지자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통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 원∼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현재는 계도 기간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5개월째인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할지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의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져 논란이 일며 "학원가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사례를 보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계도 기간이 길어지며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도 희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3 A양은 '안전모가 없으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도 안 쓰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A양은 킥보드에 대해 "유행이고 가오(얼굴·자존심)"라며 "빠르니까 타고 장난치는 게 유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러 명이 타는 것을 뜻하는 '이(二)치기', '삼(三)치기', '사(四)치기' 등의 은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에서 중3 B군은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건 한 명만 돈이 있을 때"라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의 잇따른 위험 운전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이 한때 추진했던 PM 전용면허 도입도 동시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전용면허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보다는 면허증 확인과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PM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이동 수단이라 최대 속도를 낮춰야 한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반복적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무면허는 기본에 '삼치기', '사치기'까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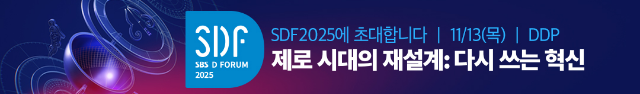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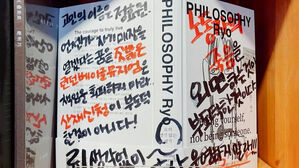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