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기술 탈취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뺏어갔다는 걸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를 제시해야 소송을 걸 수 있는데, 대개 증거들이 상대 기업에 있다 보니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해결 방법을 김민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한화 측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들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확보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원래 출장을 다닐 때 데스크톱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민/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가해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 기업이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엔 기술을 베꼈다고 의심받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엔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거부하거나 영업비밀이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법원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희경 변호사/SJ이노테크 대리인 : 현행법상 존재하는 증거 신청을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1심에서는 아예 못 구했었고 행정소송은 저희가 열람 등사 제한이 걸려서 아예 그 기록 보지도 못했어요.]
1심에서 패소했던 SJ 이노테크가 항소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부단한 증거신청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한화 제품의 일부 부품리스트를 확보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 중인 증거개시 제도와 같은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양측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2일 중소기업 간담회) : 기술 탈취를 당했던 기업들이 모두 다 본인이 입증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일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논의된 바 있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영업 비밀 노출이나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박태영, VJ : 김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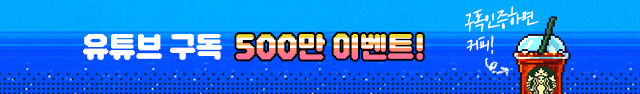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