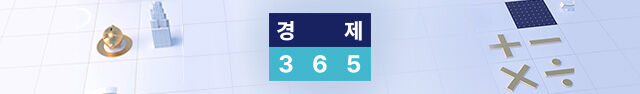'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압구정 100억 원 아파트' 등 고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와 수도권에 각각 6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씨가 10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는 사례를 가정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50%로 같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아 똑같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5년·거주기간 10년 가정)와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1천800만 원∼7억1천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아도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주택 규모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10∼30%포인트)을 매기도록 했으나, 2022년 5월부터 1년씩 세 차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울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해 평균이 13억2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 원'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수 기준 과세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미 초과 수요 상태인 수도권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 가격·위치·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득세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일 때 8%, 4주택 이상일 때 12%가 부과됩니.
서울의 2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더 사면 8% 취득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의 수요가 쏠리면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세제 때문"이라며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도록 하되, 보유가 부담된다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똘똘한 한채'는 비과세·지방2채는 과세…세금이 만든 서울 쏠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