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수항 인근 바닷속, 계란판과 컵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녹거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폐사한 바다거북을 부검해 보니,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 삼킨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137억 톤 정도, 이 중 11%만 재활용됐고 76%는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자연에서도 생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준영/CJ제일제당 BIO연구소 Synthetic BIO 담당 : 생분해성 플라스틱(PHA)은 미생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고분자 소재입니다. 해양과 토양 등 환경에 노출 시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인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면 미생물을 조작하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사공학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엽/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 대사공학은 생명체의 대사회로를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실제로 조작해서 만듦으로써 유용물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온실가스를 원료로 쓰는 방식도 시도 중입니다.
미생물이 온실가스를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대기 중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상우/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대사 경로와 플라스틱 생산 경로를 원하는 대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는 반응성이 낮은 탓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많은 공정과 에너지가 투입돼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기엔 현재로선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서상우/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가스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인프라, 대규모 생산 공정으로의 확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규제 이슈,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까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전문가들은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이 활성화되려면, 기술 개발을 넘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업계와 소비자 호응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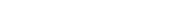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