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사례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1,159억 원이 모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나눔으로 치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부에 대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기부금 대부분이 기부단체 운영비로 쓰인단 내용인데,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직접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 10%만 이재민에게? '산불 기부금' 따져보니 (4/7 8뉴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댓글 등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의혹이나 가짜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댓글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Q.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이 생각나서…기부해도 될까요?
그러나 당선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기부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 수사로도 이어져 지난해 11월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기부금 유용 가능성을 논할 때 윤 전 의원의 사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모인 기부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윤 전 의원의 모금 활동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된 후원회원으로부터 가입금과 회비 등을 받은 것이므로 기부금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에 나선 대표 기부단체들은 모두 당국에 모금 활동에 대한 등록을 마친 곳 들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부터 사용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당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받고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해 유죄가 인정된 윤 전 의원과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기부단체들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기부금으로 단란주점 갔던 단체 아니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2천만 원 가까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워크숍 비용을 집행한다면서 정작 워크숍 목적에 맞지 않게 스키장, 레프팅, 바다낚시에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났던 겁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이 뉴스는 여전히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 내가 낸 기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냔 불안과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벌어진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0년 이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 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대상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모든 기부 사업의 지출 내역도 분기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자정 노력을 한 덕분에 평가 4년 만인 지난 2015년 청렴도 점수는 8.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인 7.78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Q. 기부금의 9할은 기부단체 운영비, 인건비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 기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집과 집행 과정에서 드는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커지면서 실제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건 기부금 중 1할에 불과할 것이란 주장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 대부분이 부대비용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처럼 사전에 기부 목적을 명시할 경우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기부금 중 일부를 쓸 수 있는데, 법에서는 기부금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0% 이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홍보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대비용에 많이 들어가도 기부금의 10%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두고 "아니. 10%나 기부단체가 떼어간단 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10%는 어디까지나 한도일 뿐, 기계적으로 10%를 떼어간단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고, 당시에도 전국에서 약 8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때 대한적십자사는 한 해 동안 121억 원을 모금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나 홍보비 등 부대비용으로 나간 건 3.5%인 4.2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됐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번 산불로 모인 기부금도 95% 이상은 오로지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선의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짜인 법 위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잘못과 거기서 비롯된 오해가 기부금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문제없으니 믿어 달라.는 기부금 단체들의 호소만으로는 이런 의심과 불신을 지우긴 어렵다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이런 불신을 뛰어넘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재: 안상우 / 영상취재: 김학모, 조창현 / 영상편집: 원형희 / CG: 방민주 / 작가: 김효진 / 인턴: 조장하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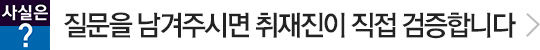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명일동 땅꺼짐과 '같은 공법' 썼다?…지반 상태 '매우 불량'](http://img.sbs.co.kr/newimg/news/20250414/202060866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