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안동시 운흥동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한 어르신이 뒷짐을 진 채 이동하고 있다.
"집에 가서 뭘 할 수 있어야 돌아가죠. 집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오늘(27일) 오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전 모(72) 씨는 체육관 2층에 올라 텐트가 설치된 아래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화재로 한평생 떠나본 적 없는 집을 잃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와 전 씨의 집이 있는 안동시 길안면까지 덮쳤습니다.
마을에서는 대피 방송이 나왔고, 시청 공무원을 따라 이곳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하룻밤 뒤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채비하는데 먼저 도착했던 이웃으로부터 "전 씨 집이 타버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집에 가보니 정말 잿더미가 됐다. 집 주변에 거름을 주려고 콩 껍질을 놔뒀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던 건지 불길이 집을 덮쳤다"며 "마을 중에서 우리 집이 가장 피해가 크다. 대체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는지 모르겠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씨 마을에는 현재 물이 끊겼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웃집에 가서 며칠만 지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씨는 "대피소에서 집까지 차로 30분이 넘게 걸려서, 이웃집에 지내면서 아직 타지 않은 사과나무 가지치기라도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싶은데 이웃집에 물이 없어 생활할 수가 없다"며 "집 앞에 둔 농기계 몇 개만 남았다. 70년 모아놓은 재산이 싹 날아갔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비슷한 시간 안동체육관으로 온 박 모(66) 씨 부부는 이틀 전 '가작히'('가까이'의 경상도 방언) 불이 다가왔던 그날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의 집 역시 이틀 전 오후 불길이 덮쳤습니다.
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퇴직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테라스까지 갖춘 규모가 큰 집이었는데 기름칠이 된 테라스의 데크가 오히려 불쏘시개가 돼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박 씨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옆집에서 물을 끌어다가 열심히 불을 끄려고 고군분투했으나, 불은 집을 다 태우고서야 3시간 만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멀리 산에서 불이 났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불이 가작히 오더니 집으로 붙었다"며 "지하수가 나오는 옆집에서 물을 끌어다가 불을 막 끄려고 했는데 도저히 잡히질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한 달 전 뇌실에 물이 차는 '수두증'으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꾸만 허리가 저리고 어지럽지만 당장은 대피소에서 머무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을 찾질 못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타지 않은 창고에 텐트와 이불이 한 채 있어 불편하더라도 창고에 있고 싶은데 안전한지를 모르겠다"며 "불이 정말 무섭다. 바람을 타고 눈앞에서 불길이 날아다녔던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무섭다"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안동의 산불 진화율은 52%입니다.
불길이 안동 시내 방면으로 확산하는 만큼 진화 작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 피해 복구는 차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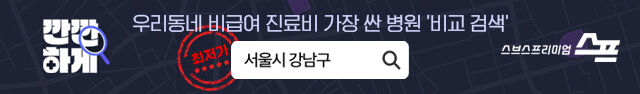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