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당초 A 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 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이어서, B 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무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문건은 경기도 일대를 포함한 군부대의 규모·위치·작전수행능력, 특히 부대배치현황이 담긴 예비전력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 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 씨 관련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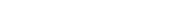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