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금 인상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 지하철 이용 비용은 최소 9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조사국 중 1위인 전체의 41%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현행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제+구간 운임제'로 계산됩니다.
탑승 시 성인 기준 승하차 구간 거리 10km까지는 기본운임 1천400원을 내고,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돼 하차할 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974년 개통 당시 30원으로 출발한 뒤 차츰 인상돼 1981년 1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1천50원으로 올라 첫 1천 원의 벽을 깼고, 2015년과 2023년 각각 1천350원과 1천400원으로 인상돼 현재의 요금이 됐습니다.
거리나 노선에 따라 각국의 체계가 다르지만, 주요 도시의 단일 승차권 기본운임은 뉴욕이 2.9달러(4천238원), 런던이 2.8파운드(5천192원), 파리가 2.5유로(3천862원), 도쿄가 180엔(1천747원) 등으로 서울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쌉니다.
한국보다 지하철 요금이 저렴한 도시는 상파울루가 5헤알(1천237원), 베이징이 3위안(600원), 모스크바가 60루블(973원), 멕시코시티가 5페소(126원), 델리가 10루피(166원) 등으로,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우리와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이었습니다.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도 서울의 지하철은 저렴한 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지난해 자료를 분석하면 영국의 지하철 요금은 서울보다 4배 이상 비싸고 독일, 프랑스, 미국 등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성인의 평균 소득 대비 지하철 1회 탑승에 대한 지출 비율도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세계 각국 네티즌이 참여하는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현지 교통수단 편도 승차권 '(버스·지하철 등 포함) 집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교통 운임이 127개국 중 48위(1.03달러)로 주요국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교통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 주체는 왜 2년 만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까? 이는 만성적인 적자와 늘어나는 부채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 833억 원에 달했고 차입금에 따른 하루 평균 이자만 3억 7천만 원씩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설립 이래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지하철과 전국 단위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에는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국민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 여깁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각각 서울시와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공기업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적자에도 쉽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부채와 적자 폭이 늘어난 데에는 적자 노선 유지, 안전 설비 투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낮은 운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승객 한 명당 798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승객 1인당 수송 원가인 1천760원에 미치지 못하고, 환승 금액 등을 제외하면 평균 운임이 962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호응이 좋은 서울시의 월 정액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이지만 매년 1천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발생시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명에 기업 이름을 병기해 광고 수익을 늘리거나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익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철도학회 논문 '도시철도 운임체계 국제 비교'(2020)는 "서울교통공사는 원가 대비 운임의 보전비율이 73%이나 외국 주요 도시는 100%를 상회하고, 인-km당 운임(승객 1인이 1km 이동한 수송량)은 외국과 2∼4배 수준차를 보인다"며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원가 수준으로 운임을 조정하고 다양한 승차권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런던처럼 지자체와 시의회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성 등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도 낮은 기본 운임만큼이나 적자를 가중하는 요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에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던 1980년대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한 자릿수대였지만, 현재는 전 국민 중 20%가 노인이고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자체와 공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차등적 무임승차 적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복지 후퇴라는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여가 활동 증가, 노인 보건 향상,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에 따른 의료비,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우울증 예방 등의 절감액은 2020년 기준 연간 약 3천6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외에서는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무임승차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시간대·소득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할인 또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거나 혼잡 시간대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룩셈부르크도 저소득층에는 무료, 일반 노인은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노인 교통 할인제도는 없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별도의 '실버 패스'를 지급합니다.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 자료인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2016)은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중앙정부는 철도 운영기관에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고, 무임손실 지원 주체의 명확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교통학회지에 실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제안' 보고서는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요금을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비싸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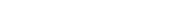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