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두 학교 학생들은 공식 명칭과 상관없이 자기 학교 이름을 앞세워 부른다. 그걸 바꿔 불렀다가는 각자의 캠퍼스에서 역적 취급을 당할 것이다. 가나다 순으로 해야한다는 둥, 특정 학교부터 불러야 발음이 편하다는 둥, 명칭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이해 관계도 없고 크게 관심도 없는 대중들은 대체로 연고전으로 많이 부르는 듯 하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불러왔다.
한중일(韓中日)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화요일, 공용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예닐곱 개의 조간 신문을 훑어보는데 각 신문의 1면들이 거의 똑같은 사진을 싣고 있어 흥미로웠다. 그러다보니 각자 제목들은 어떻게 달았는지 다른 때보다 더 눈에 들어오게 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명박 대통령-원자바오 총리-아소 다로 총리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중국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 때는 세 나라가 상설 사무국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1년에 정부 간 국제기구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했다.(예산은 세 나라가 분담)

2013년 광주에서 열린 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때 사진을 보면 삼국 문화부장관 뒷배경에 '중한일'로 크게 표기된 중국측 회의 명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에서 열렸던 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일한 문화부장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일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윤석열 정부냐하면 그건 아니다. 이미 그 전 정권들도 공식 문서와 발표에서 '한일중'으로도 표기해왔다. 지난 2015년,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결단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그 직후에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청와대 공식 발표문 등에서 '한일중'으로 표기했다. 2019년 중국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오후 2시부터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중인지 한중일인지 매번 혼란스러워서 2010년부터 정상회의 개최 순번으로 정했다"는 청와대 방침을 전했다. 자국 이름을 앞세우고 뒤에는 다음 개최지를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말했고 귀국길에는 페이스북에 '청두를 떠나며-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글을 남겼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뉴스빅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검색하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00건의 기사가 나오고 '한일중 정상회의'로 찾아보면 2008년부터 3,32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올해에만 1,000건이 넘는다. 건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두 배 이상 많지만 상대적으로 최근 기사에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동아,경향,한겨레,매일경제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한중일'을 검색하면 843건, '한일중'으로 검색하면 40건의 기사가 나온다. (실제 검색 결과는 149건 이지만, '아무개가 한 일 중에'란 뜻으로 쓰인 경우는 제외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수십 년 전에도 '한일중'을 아예 안썼던 건 아니다. 일례로 1953년 1월23일 동아일보 1면 기사에는 '한일중(韓日中)의 요로당국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다만 우리는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한중일로 불렀고, 언론에서도 한중일이라고 썼다. 언중들에게도 한중일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웠다. 역대 정부가 '한일중'으로 공식 문서에 표기를 하더라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이 모두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썼기 때문이다. 언론은 언중의 정서와 언어 습관을 반영해 기사를 쓴다.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쓸 거 같으면 관보다.
필자는 지난 2015년에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주관하는 한중일 기자 합동 취재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기자 십여 명이 세 나라를 돌아가면서 방문해 함께 취재하고 문화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당시 중국과 일본의 정치인, 고위 관료, 학자 등을 중일 양국 기자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이 각급 취재원과 관계맺는 법 등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2년씩 사무총장을 맡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2011년 서울에 설치된 이래 13년 동안 명칭에 대해 삼국 간에 특별히 드러난 잡음없이 유지돼왔다. (공식 영어 명칭인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에는 국가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국명을 앞세워 부른다)
그런데 '한중일이냐, 한일중이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지난 주, 사무국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봤더니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초에는 분명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라고 쓴 걸 봤는데 엊그제부터는 기관 소개 메뉴의 '사무총장 인사말'과 최신 뉴스 메뉴 등 일부 콘텐츠에서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으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 (현재 사무총장은 한국 측이 맡고 있다)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메뉴의 하위 항목인 '개요'에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항목인 '사무총장 인사말'에는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이라고 쓰는가 하면, 최신 뉴스로 올려놓은 소식의 제목은 "한일중3국협력사무국, 서울 청계광장서 '한중일 협력의 날' 기념"이라고 명칭을 오락가락하며 달아놓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수준의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공식 명칭을 뒤죽박죽 쓰는 데가 어디 있나 싶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런 일이 현재 미디어들 사이에서는 물론, 하나의 미디어 안에서도, 심지어 한 기사 안에서도(제목 다르고 본문 다르고) 벌어지고 있다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변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하는 성장통인가? 우리,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걸까?
이 와중에 네이버는 언제 재바르게 바꿨는지, 이미 지난 주초 (이전)부터 자사의 지도 서비스에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카카오맵은 여전히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돼있다) 네이버가 어딘가의 요청을 받아서 했든, 알아서 챙겼든 어떤 '작위(作爲)'가 발생한 것이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홈페이지가 거의 100% '한중일'로 표기할 때도 네이버는 이미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이라고 쓰고 있었다.
요컨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대부분 관례적으로 한중일이라고 쓰고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 한중일과 한일중을 모두 사용해왔다. 언론도 두 용어에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한중일로 표기해왔다. 윤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때에 따라 한중일도 쓰고(9월12일 국무회의) 한일중도 썼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던대로 써오던 명칭이 이번 한중일/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기저기 기사나 칼럼 등에서 많이 회자됐다. 어디에선가 '부자연스러움' 또는 '부자유스러움', 즉 '작위'의 기미(幾微)가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언중이 오랫동안 써온 말은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최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로 떨어졌다. 2022년에 43위, 지난해 47위에 이은 추락이다. 삼국 가운데 일본은 70위, 중국 170위라는 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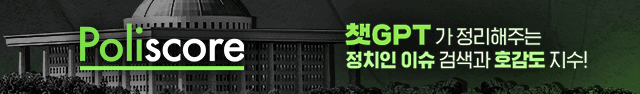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