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압된 것의 회귀"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22살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는 이란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내기보다는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 지난 9월 13일, '히잡 불량 착용'을 이유로 이란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다가 쓰러진 마흐사 아미니.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그녀의 죽음을 밝히려는 자들은 감시를 받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자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해소됐어야 할 분노와 슬픔, 원망, 절망 등은 켜켜이 쌓여 이란 전역으로 확산했고, 마흐사 아미니의 40일 기일에 맞춰 더 큰 물결로 돌아왔습니다.

유혈 진압에 나선 당국
당국은 총칼을 동원한 유혈 진압을 택했습니다. 최근 BBC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서쪽에 위치한 카라지의 한 공동묘지 인근에서 유혈 진압이 있었단 목격자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보안군은 군중을 향해 발포했고, 흉기를 이용해 확인 사살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카라지에는 지난 9월 21일 히잡 시위 중 숨진 22살 여성 하디스 나자피의 사망 40일을 기리기 위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그녀가 묻힌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나자피 역시 40일 전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란의 유명한 틱톡커 하디스 나자피는 시위에 나가기에 앞서 머리끈을 묶는 마지막 영상을 끝으로 지난 9월 21일 숨졌다. 총알을 6발이나 맞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녀의 죽음은 히잡 시위를 더 불붙게 만들었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유혈 진압 역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당국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16명이 숨진 걸로 알려진 이란 남동부의 카쉬 지역에서는 보안군이 또다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란의 서부 도시 풀라드샤르에서도 보안군이 쏜 총에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그 곁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란 서부 풀라드샤르 지역에서 지난 3일 보안군의 총격에 한 여성이 또 희생됐다.
최대 위기 직면한 이란 정부
그러나 이란 당국은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히잡 착용은 물론, 지난 40년 동안 축적된 다른 억압의 기억들까지 분출돼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히잡 시위 초기에는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미국 중심의 제재에 완전히 무너진 나라 경제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권위주의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이란 내 이슬람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면서 성직자에게 몰래 다가가 터번을 벗기는 영상들이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자국 내 소식을 알리면서 시위(Protest)가 아닌 혁명(Revolution)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979년 혁명을 일으켜 팔레비 왕조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탄생한 지금의 이란 정부가 40년 만에 또 다른 혁명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 혁명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새로운 혁명으로 이란 시민들이 겪을 희생과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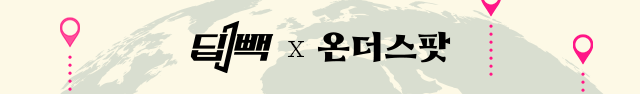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