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에 사는 동부 저지대 고릴라 역시 25년 사이(1994∼2019년) 개체 수가 80% 줄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 분포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 등 척추동물 5천230개 종을 대표하는 3만1천821개 개체군의 규모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48년간 평균 69% 감소했다고 세계자연기금(WWF)이 13일(한국시간) 밝혔습니다.
WWF는 런던동물학회(ZSL)와 함께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22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하면서 서식지 파괴, 자원 남용, 외래 침입종 유입, 환경오염, 기후변화, 질병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개체군 규모 감소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등의 열대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1970년 이후 개체군 규모가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에서는 각각 66%, 55%씩 줄었습니다.
북미에선 20%,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18% 감소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담수생물이 83%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인구 50% 이상이 담수로부터 3㎞ 반경 이내에 살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산란과 월동을 위해 강과 바다 사이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은 76%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서식지 감소와 이동 경로를 막는 구조물 설치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페놉스콧 강에서 댐 2곳을 해체하고 나머지 댐을 정비한 후 청어 개체 수가 5년 만에 수백 마리에서 200만 마리로 늘어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샥스핀 등 고급 식재료로 사용되는 상어나 약재로 활용되는 가오리의 개체 수도 71% 감소했습니다.
특히 3대에 걸쳐 개체 수가 95% 감소한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 가운데 '위급(CE·Critically Endangered)'으로 재분류되기도 했습니다.

WWF는 '지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증가세로 반전시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WWF는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는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 인간이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에 원인이 있다"며 생태계의 재생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윤희 WWF 한국지부 사무총장도 "이번 보고서는 자연을 한계 이상으로 이용해온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경고"라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하려면 정부, 기업, 소비자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후 위기와 생물종다양성 감소 문제를 균형감 있게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식재 사업을 진행할 때 단일한 외래종을 대규모로 심는 경우가 있다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WWF의 지구생명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는 직전 보고서엔 없던 838개 종 1만 1천10 개 개체군의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표본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직전 보고서에서는 1970∼2016년 4천392개 종 2만 811개 개체군의 규모가 68% 감소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진=세계자연기금 제공,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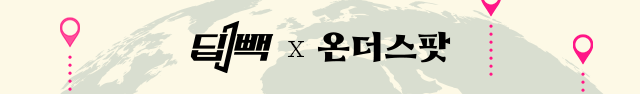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