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 미국의 경제 수장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고용 시장이 이렇게 튼튼한 데 어떻게 경기 침체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역시 "고용 시장이 매우 강력한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옐런 장관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비관론과 낙관론이 난무하는 탓에 고용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라는 새로운 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낙관론 :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고용 시장"

▲ 실업률과 전체 고용 인구 비교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한다면,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은 줄고 해고는 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고용시장은 경기 침체 시기의 고용 시장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비관론자들보다는 옐런과 파월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기이하다(mysterious)'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노동 인구 340만 명과 수급 불균형

▲ 노동인구 인구 감소
사라진 노동 인구 340만 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는 1천69만 개에 달했지만, 6월 한 달 동안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 건 6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지만) 수치로만 따지면 약 430만 개 일자리가 일할 노동자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공석인 상태인 겁니다.
지난 2020년 2월은 어땠을까요? 신규 일자리는 688만 개, 실제 고용 인원은 589만 명으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가 100만 개였습니다. 지금은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가 430만 개 수준이니까 대략 330만 개가 더 늘어난 셈인데, 공교롭게도 미국 노동 시장에서 사라진 노동자 340만 명과 수치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실업률도, 전체 고용 인구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했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노동 참여율을 낮아졌고 이는 지금의 미국 고용 시장에서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 내구재 제조업 등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 미 산업별 일자리 수급불균형
비관론 : 사라진 노동 인구가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사유로 노동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 1)자산 증가, 2)이른 은퇴, 3)돌봄 서비스 부족, 4)창업 선택. 이 가운데, 이른 은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까지 300만 명이 고용 시장을 떠났습니다. 또, 팬데믹 위기가 시작한 2020년 봄, 350만 명의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퇴는 베이비붐(1946~1964년 출생 : 약 7600만 명) 세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 충분한 자산 축적 등을 이유로 쉽게 노동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산업은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됐지만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둔 여성의 노동 참여율 역시 팬데믹 이전인 수준(70% → 55%)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노동 인구 가운데 많은 수가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마음이 크지 않거나 돌아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 돌아올 수가 없다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수요를 더 크게 줄여야 합니다. 즉, 긴축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7월 고용 지표를 다시 본다면, 앞선 해석과 전혀 다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는 미국의 7월 고용 지표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 고용 시장은 누군가에는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조치도 버텨줄 수 있는 튼튼한 고용 시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웬만한 긴축 조치로는 진정시킬 수 없는 타이트하고 불균형한 고용 시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조치에 나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 없는 약한 침체를 거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벼운 침체는 망상에 가깝고 물가 상승 압력과 불균형한 고용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긴축 조치가 필요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연준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합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긴축 조치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강력한 긴축 조치는 자칫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가는 만성적인 고물가가 경제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 시장만이 이 줄타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전쟁의 장기화, 최악의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외부 변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고용 지표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 시장이 연준의 줄타기에서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취재파일]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가벼운 침체일까? 침체의 전조일까?](http://img.sbs.co.kr/newimg/news/20220823/201694478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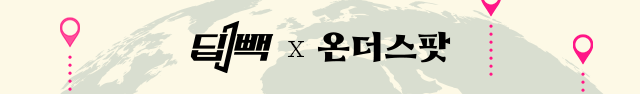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