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흔히 호스피스 업무가 무척 힘들고 우울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와 정반대라고 대답한다. 호스피스에는 용기와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 등 인간 본성의 선한 자질이 가장 정제된 형태로 존재한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수시로 목격한다. 내 주변엔 자신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로 가득하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中
11월 14일, 북적북적에서 소개하고 읽어드리는 책은 레이첼 클라크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박미경 옮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지난 달 번역돼 나온 이 책은 앞서 영국과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의사인 레이첼 클라크는 영국 NHS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완화의료 전문가예요. 시골 동네병원 의사였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인정 많고 친절한 의사상을 마음에 품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의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레이첼은 처음엔 응급의학에 관심이 컸지만 병원에서 여러 환자와 의사를 보면서 점점 다른 쪽에 마음이 갑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가혹할 만큼 화학적 치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대의학이 환자를 인간이 아니라 질병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환자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최대한 편안하고 품위 있게 머물다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레이첼에게는 더 중요해집니다.
라틴어 동사 펠리에어(palliare)는 '외투를 입히다, 덮어 감추다'라는 뜻으로, 완화 의료(palliative medicine)의 1차 목적이 죽음의 증상을 숨기는 데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말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모르핀에 취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말고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완화의료를 떠받치는 원칙을 하나만 꼽자면, 살아감과 죽어감은 이항 대립처럼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짝꿍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中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완화의료가 죽어가는 환자가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환자가 그 시간을 충분히 덜 불행하게 더 행복하게 보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또다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저자는 '죽음에 대해 침묵해선 안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게 마련이고 그걸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 '죽음을 똑바로 보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다른 형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될 수 있다고요.
이 책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의 연장에 괴로워하는 환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마지막 시간을 좀 다르게 보내며 의미를 찾게 된 여러 환자들의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스피스 의사인 레이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2017년 당시 일흔 넷이던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립니다. 검사 결과 간으로도 전이된 상태였죠. 수술과 여러 차례의 항암치료에도 암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결국 아버지는 마음을 정합니다. 화학 요법을 중단하기로요.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이듯, 아버지와의 이별은 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갈거야."
…(중략)…
아버지는 떠나고 없어도 내 환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놀라우리만치 감미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완치는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 웃고 울고 감탄하고 위로할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中
이 책을 통해 레이첼의 환자들과 아버지를 만나면서 독자는 죽음과 삶에 대해 깊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자는 환자들이 '불꽃이 꺼지는 순간에 기를 쓰고 바라본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썼습니다. 또 필립 라킨의 시 '아룬델 무덤'을 인용해 이렇게도 썼어요. '우리 중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Dear Life: A Doctor's Story of Love and Loss』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의 낭독 허락을 받았습니다.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호스피스 의사가 아버지를 떠나 보내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 레이첼 클라크 [북적북적]](https://img.sbs.co.kr/newimg/news/20211114/201609442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회의 중인데 '백반집 결제'…"김병기 마누라에 카드 줬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898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대학 편입 좀" 김병기 아들 받아준 중소기업, 수주 급증](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89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장병들 '급식비' 600억도 안 줬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924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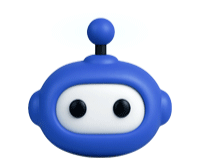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