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3시 36분,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한국당 소속)의 발언으로 국회 본청 220호 문이 닫혔다. 2월 8일 한국당 의원 3명의 5·18 망언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윤리특위는 시작 16분 만에 '깜깜이'가 됐다. 민주당 의원 노트북 전면에 붙은 '5·18 망언 의원 제명!' 피켓을 두고 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거친 항의, 16분 사이 공개된 일의 전부였다.
1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4시 29분, 닫힌 문이 열리고, 한 줄의 내용이 전달됐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했습니다.(박명재 위원장)" 망언 의원 징계 여부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뒤에야 결정 가능해졌다.
의원 징계가 지지부진하단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법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 46조엔 국회 윤리특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이 아닌 '국회 규칙(215호)'이다.
국회가 법과 규칙을 따른 걸 비판할 수 없다. 국회가 당연하듯 헌법(54조 예산 처리 시한)을 매년 어겼더라도, 심지어 이번 윤리특위조차 국회법 5조2, '2월 임시 국회' 조항을 지키지 않은 탓에 한 달이 지나서 열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법을 지켜 온 시민 입장에선 법치에 대한 회의와 박탈감도 크겠지만, 어찌 됐든 법은 준법으로 유지 가능하고, 이런 책임감은 국회의원에게 더 무겁게 적용된다.
●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법 징계 절차
의원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 "억울하다." 알려진 것보다 부지런하고 정력적이며, 시민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데, "대폿집 껍데기마냥 매일 씹히는 게 의원"이라고 한탄한다. 산술적으로 의원 1명당 시민 16만 명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숙명'이라 치부하기에 가혹한 측면도 있다.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원 징계 즉 '국회 윤리특위'는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 2월 8일 국회 망언 사태 이후, 한 달간 지켜본 결과다. '국회법 14장'에 징계 절차를 규정할 때부터 의도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국회법상 징계 절차는 애당초 징계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원, 그들의 특별한 신분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도 국회법상 규정된 징계 시효는 징계 자체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별한 독립성을 인정받아, 별도 법으로 징계를 규정한 법관 검사와 비교해도 그렇다.
![[취재파일] 의원 징계 불가능한 '깜깜이 국회 윤리특위'…'절차만 있고 징계는 없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311/201290721_1280.jpg)

짧은 시효 탓만이 아니다. 징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택적, 자의적'으로 만든 국회법 조항도 있다. 국회법 155조엔 '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징계할 수 있다'이다. 겸직 금지 위반, 품위 손상, 금품 수수, 기밀 누설, 재산 신고 위반 등 각양각색의 징계 대상을 같은 조항에 열거해뒀지만, 이를 위반해도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통용되는 셈이다.
반면, 검사징계법 2조엔 '검사는 각호에 해당하면 검사를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2조'에도 '비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규정하고, 위반 시 책임까지 묻고 있다. 금품 수수 100만 원 이상이면 해임, 유용액 300만 원 이상 정직 등 행위별 기준도 정해뒀다. 이런 검찰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통용되는데, 이조차 없는 국회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결과는 비상식의 상식화다. 국회의원 등 '여의도 사람'만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 단적으로 국회에선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져도 징계조차 없다. 선거가 끝나면 줄줄이 기소되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 뇌물 등 각종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의원 중 징계받은 이는 찾기 힘들다. 심지어 징계안조차 발의되지 않는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의원들은 '국회 퇴출'을 징계로 갈음하고 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벌금이 징계를 대신한다고 여긴다. 선거법·정자법엔 여야 구분이 없다 보니, 합당한 이유도 없다. 그냥 불문부답이다. 국회법 163조엔 제명 외에도 '공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감봉' 등 다양한 징계 종류를 정해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반 공직사회에선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국회에서만 태초의 자연법칙처럼 적용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기소되는 순간, 직무 배제가 되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어떤 형태든 징계를 받는다. 형별과 징계는 별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회만 예외다.
이런 국회는 빼먹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왜 이렇게 징계가 약하냐"며 부처를 질타한다. 부처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받지 않는데, 범죄도 아닌 행위를 한 우리만 왜 징계하느냐"고 되묻는다면,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간혹 징계안이 발의되는 경우도 있다. 국회법 156조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해 징계안이 제출할 때다. 문제는 후속 절차가 없다. 5·18 망언 의원 윤리특위가 열린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20대 국회에서 36건의 징계안이 들어왔지만, 결론 낸 건 한 건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성적 발언인데, 문 의장만의 책임은 아니다. 반복된 일이다. 19대 국회의 징계안 39건 중 처리된 건 '0'건. 불가능할 것 같은 기록이 매번 반복되는 건, 국회법에 징계 처리 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징계 시효는 고작 10일로 극단적으로 짧은데, 심사 기간은 극단적으로 긴 '양극단의 국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 규칙상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의 심사 기간(최장 90일)만 정해뒀을 뿐, 정작 핵심인 윤리특위 처리시한은 국회법에 없다.
쉽게 말해 자문위가 결론 내도 윤리특위가 결정 안 하면 징계는 할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에 있어 검찰과 자웅을 겨루는 사법부도 법관징계규칙 6조에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엔 이런 규칙조차 없다 보니, 하세월(何歲月)의 초식을 활용해 징계안을 줄줄이 자동 폐기시켰다.
● 투명성 담보 못 한 비공개 윤리특위…열외된 건 오직 시민뿐
어느 조직이든 징계는 엄격 공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더욱 그렇다. 이유는 하나,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의원 징계'를 '의원 손'에 맡긴 것도 이런 이유다. 시민 손으로 뽑은 의원이 다른 의원을 징계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믿음과 당위 때문이다.
목적은 좋았지만, 현실은 정반대, 징계 자체는 실종됐다. 의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가 도리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폐쇄성을 만들어 버린 탓이다. 정점엔 비공개 윤리특위가 있다. 국회법 158조 '징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상 비공개, 예외적 공개'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철저히 비공개였다.
윤리특위 소속 의원은 "비공개로 해야 소신에 따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공개되면 징계 대상자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언뜻 보면 일리 있는 이 말, 조금만 따져보면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없다.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포함 교섭단체 3당 소속 의원 18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뤄진 발언은 회의가 끝난 뒤 퍼진다. 징계 당사자는 물론, 특위 소속이 아닌 의원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열외자는 오직 시민뿐. 시민 대표성을 근거해 신중한 징계 절차를 만들어 놨더니, 시민만 배제된 꼴이다.
결과의 정당성은 과정의 투명성으로 보장될 수 있다. 회의가 공개돼야 소신 발언의 명분도 생긴다. '봐주기, 비상식, 비윤리, 비논리적 발언'을 하면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심, 이를 담보하는 게 공개회의다. 또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은 공개하면서, 이를 근거한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원론적이지만, 국회 권력의 밑천은 시민이다. 의원만이 가진 민주적 정당성이 그들을 판검사 등 다른 공무원과 구분시킨다. 더 많은 권한, 더 특별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법안·예산 심사 등 국회에서 이뤄진 공적 행위를 모두 공개하는 것도 권력 원천인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헌법 50조도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며 '원칙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법으로 '비공개'를 원칙 삼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도 못 하고, 위헌성까지 띄는 것도 결국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탓이다.
개선방안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미국처럼 의원 징계 사유와 수위를 세부적으로 정해둬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자는 요구, 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제언, 윤리특위 처리시한을 못 박아 도과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개선안도 있었다. 바뀌지 않았을 뿐이다. 징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한다. "전례가 없다." 국회의원의 상식과 선의를 신뢰했다는 제도의 태생적 결함은 있었지만, 이런 제도마저 무너뜨린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잘못이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축적돼 적폐가 된다. 국회는 나아가 적폐가 쌓여 문화로 고착됐다. 이번 윤리특위에선 전례를 깨서 새로운 문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8일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박지원 의원의 말이 귀에 자꾸 울린다. "국회 윤리특위는 일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의 예측이 부디 빗나가길.
![[취재파일] 의원 징계 불가능한 '깜깜이 국회 윤리특위'…"절차만 있고 징계는 없다"](https://img.sbs.co.kr/newimg/news/20190308/201290005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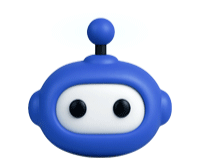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