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이른바 ‘접대 골프’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골프장의 주말 내장객은 오히려 늘었다. ‘접대 골프객’이 빠져나간 자리를 ‘내 돈 내고 골프 치겠다.’는 실수요자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인의 ‘골프 사랑’이 뜨겁다. 골프 애호가 수준을 넘어 아예 프로 골퍼가 되겠다는 열정도 화끈하다.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프로 골퍼 또는 골프 지도자 단체의 숫자를 보면 쉽게 온도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의 프로 골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두 곳이다. 두 단체 말고도 프로 골퍼 또는 골프 지도자 단체가 서른 곳 가까이 된다. 기자가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단체만 27곳에 달한다.
단체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세계를 아우르는 명칭을 쓴다. 미 PGA의 한 유명 투어 프로가 국적을 취득했다는 나라의 프로골프협회 지부까지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 또는 사업자로 돼 있다. 거의 모든 단체가 ‘프로’ 선발전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프로 자격증 즉, 회원증을 준다. 몇몇 단체는 KPGA나 KLPGA같이 상금이 걸린 투어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기도 한다. ‘프로’가 되면 소속단체와 제휴를 맺은 골프장에서 그린피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고 골프용품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KPGA와 KLPGA 회원에 비하면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도 까다롭다.
회원의 규모는 단체별로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프로단체인 KPGA는 5500여 명이고 KLPGA는 2000여 명이다. 각 단체의 ‘프로’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줄잡아서 4만 명은 족히 넘는다. 미국은 어떨까? PGA의 소속 ‘프로’ 2만 9천 명에 LPGA 회원 2,200여 명, 그리고 다른 골프단체 소속 회원까지 합쳐도 4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투어프로뿐 아니라 골프장 관리, 프로숍 운영, 레슨 등 골프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선발전을 거친 ‘프로’다. 투어프로나 티칭프로로 한정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프로’의 개념이 훨씬 넓다. 그러니 한국은 투어프로와 티칭프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로골퍼 대국’이다.
![(수정중/6일 출고)[취재파일]골프 프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http://img.sbs.co.kr/newimg/news/20180105/201133278_1280.jpg)
프로 단체가 많이 생겨난 것은 1998년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골프 붐이 인 데서 비롯된다. 너도나도 골프채를 쥐기 시작하면서 골프 지망생들도 급속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KPGA나 KLPGA에서 프로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고시보다 더 어렵다. 두 단체가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 ‘소수 정예’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삼수 사수를 하고도 관문을 뚫지 못한 지망생들이 쌓이고 쌓였다. 여기에다 자기의 뛰어난 골프 실력을 프로 자격증으로 확인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실력파 아마추어까지 크게 늘어났다. 이런 토양 위에서 프로 골프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프로 단체들의 설립시기가 2000년대 초중반에 쏠려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30여 개의 단체 가운데는 엄격한 선발과 회원 관리로 골프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모범적인 조직이 여럿 있다. 반면,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단체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 프로 입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도 생겨났다. 이들 단체 출신 프로 가운데는 ‘KPGA나 KLPGA 출신보다 한 수 아래’라는 비아냥을 딛고 뛰어난 골프 교습가로 우뚝 선 사람도 많다. KPGA나 KLPGA 프로 뺨치는 실력을 갖춘 프로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프로가 배출된 까닭에 자격증을 썩이는 프로가 태반이다. 중장년 프로들 가운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고 마는 이도 드물지 않다.
![(수정중/6일 출고)[취재파일]골프 프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http://img.sbs.co.kr/newimg/news/20180105/201133277_1280.jpg)
미국 PGA처럼 티칭 프로 등 골프업계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펴면서 수준과 질을 관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KPGA KLPGA는 투어 프로뿐 아니라 티칭 프로 등 골프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큰 포용력을 발휘해 주길 권한다. 지망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프로 자격증을 골프 실력을 과시하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골프문화도 이참에 개선됐으면 한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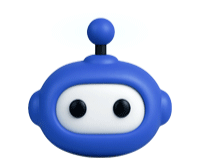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