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바우만 인스티튜트
그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일간지 주말 북 섹션에 그의 책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렇다고 내가 그 책들을 다 읽은 건 물론 아니다) 『리퀴드 러브』, 『유행의 시대』, 『우리는 왜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사회학의 쓸모』…. 몇 년 전부터 그의 책이 봇물 터지듯 한국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세어보니 2010년 이후에만 20권이 번역됐다) 나는 그가 한창 지적 생산물을 토해낼 만한 연령대의 인물인 줄 알았다.향년 91세. 이 시대 또 한 명의 현인(賢人)이 새해 벽두에(9일) 타계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저작 활동 때문인지 그의 부고 기사를 들여다보면서도 (몇몇 신문에서는 크게 다루었다) 왠지 생경하다. 바우만은 2000년대에 들어 ‘유동하는 현대’-또는 ‘액체 현대’로 번역하는 ‘liquid modernity’- 시리즈를 펴내 크게 주목 받았다. 나 역시 그가 던진 ‘liquid’란 개념에 끌려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다. (이상하게 서로 안 붙을 것 같은 개념어를 붙여놓는데 매혹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간된 ‘만주 모던’ 같은…)
그런데 따져보니 1925년 생인 그가 현대성(modernity)을 ‘액체성’이라는 특질로 파악한 첫 책 ‘유동하는 현대’를 내놓은 게 그가 75세 되는 해였다. 그의 성실성과 용기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부음을 듣고 책장을 뒤져 『유행의 시대』(원제 Cultures in a liquid modern world, 2011년 출간-바우만이 86세 되던 해)를 꺼냈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과 위치를 다룬 책이다.
이 책에서 바우만은 계몽의 시대에는 문화가 ‘사회가 보편적인 인간 조건을 향해 진화하도록 방향을 잡는 항해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후 부르디외가 『구별짓기』(distinction, 1979)에서 밝혔듯이 ‘계급 구분과 사회적 계층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려고 고안된 기술’로 변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던 문화가 사회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유동하는 현대’, 바로 지금 문화의 모습은?

‘소비 사회 속에서 문화는 잠재적인 고객들의 혼을 빼놓으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 속에 경쟁 하고…소비를 기다리는 상품들의 보관소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깐깐하고 확고한 기준을 버리고 분명한 선호도 없이 모든 취향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선호의 ‘유연성’(‘줏대 없음’을 오늘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단어)과 즉흥적이고 불합리한 선택은 이제 가장 분별 있고 올바른 것으로 추천되는 전략의 특징이다.’
(유행의 시대, P25)
미디어 ‘시장’에서 일하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하는 현대’를 실감한다. 전통 미디어의 (그래 봤자 100년 역사도 안 된 TV지만) 뉴미디어 부문에서 일한 지 2년, 소위 ‘뉴-미디어’는 이제 변화의 양상과 속도 모두에서 ‘초(hyper)-미디어’(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뉴-미디어 세상은 때로는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소비자’(유저? 독자? 시청자? 수용자? 뭐라 불러야 할지 이마저도 헷갈리는 게 이 ‘씬’이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세상이다. (페이스북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보라. 엄지 손가락으로 휘휘 스크롤링할 때 한 콘텐츠에 멈추는 순간은 채 1초도 안 된다. 바로 그 시간이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시선을 붙잡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십상이고 콘텐츠의 휘발성에 기댄다. 때로는 그 휘발성 덕분에 살아남기도 한다. 휘발하지 않을 무거운 콘텐츠, 숙성된 생각을 담은 콘텐츠는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휘발하기를 바라면서(너무 깊이 생각해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엉터리 같은 뉴-미디어 콘텐츠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86세의 바우만은 마치 이를 미리 예견한 듯 갈파한다.
‘유동하는 현대사회의 소비 지향적인 경제는 과잉 공급 (도대체 얼마나 많고 또 비슷비슷한 미디어들가 콘텐츠들이 뉴-미디어 공간에서 부유하는지)그리고 공급된 것들이 빠르게 노화해 결국 매력을 잃는다는 점에 의존한다.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소비자의 욕망을 일깨울 만큼 충분히 매혹적인지 미리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사항에서 현실을 가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뿐이다.
이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게 가능했다면 마케팅이란 게 필요 없겠지) 문화가 상대주의과 다원주의에 지나치게 기대게 된다. 뉴-미디어 세상에서의 ‘콘텐츠 상품’ 역시 줏대를 가지기가 쉽지 않고 ‘유연성’(바우만의 얘기대로 ‘줏대 없음’을 오늘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단어)은 넘쳐난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대한 백화점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의 여러 매장 중 하나로 자신을 바라 본다… 계산대의 광고와 선반에 진열된 상품들은 -페북으로 바꿔 말하자면 타임라인은(필자 주)- 선천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순간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도록 계산되어 (조지 슈타이너의 유명한 말처럼 “극도의 충격을 주고 그 즉시 진부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문화를 ‘(뉴-)미디어’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유동하는 현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극도의 충격을 주기도 힘든데, 그 즉시 진부해지라니.
P.S 1 『Ways of seeing』의 작가 존 버거도 지난 2일 향년 90세로 타계했다. 그는 엄청난 학위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는 지성인이었고 농부의 삶을 실천하던 지식인이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났듯이 학계와 정계에 알량한 외국 유명대학 학위 종잇장에 기댄 쓰레기 같은 슈도-지식인들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진짜 지성인들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사실이 슬프다.
P.S 2 박세일 전 의원도 15일 타계했다. 조선일보가 ‘경세가’(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그럴듯한 용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름 붙인, 중도보수 성향의 학자였다. 그는 늘 보수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지식인이었다는 인상이 남아있다. 바우만이나 존 버거에 비하면 한창 나이에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더 추진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인생무상이다.
![[이주형의 라이프 저널리즘] 새해에 떠난 지식인들](https://img.sbs.co.kr/newimg/news/20170117/201015528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회의 중인데 '백반집 결제'…"김병기 마누라에 카드 줬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898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대학 편입 좀" 김병기 아들 받아준 중소기업, 수주 급증](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89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장병들 '급식비' 600억도 안 줬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07/202144924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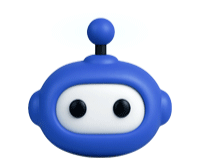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