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어귀에서 만난 임순옥(88) 할머니는 좁고 더운 집을 피해 밖으로 나와 나무 평상에 앉아 더위를 쫓았다.
"굴이고 바지락이고 한껏 다 캤지. 내가 요 바닷가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 할머니는 연신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을 훔쳐내며 "일본군이 패망하기 전 1945년 이북의 한 작은 섬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고 말을 이었다.
그렇게 배를 타던 남편을 따라서 인천 연평도에서 3년을 보낸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배를 잃었다.
"남의 배를 타든 뭘 하든 뱃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남편의 말에 가까스로 정착한 곳이 바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이었다.
임 할머니는 그렇게 70년 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칠 남매를 키웠다.
그는 마을의 '터줏대감'이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이 쪽방촌은 임 할머니처럼 타지에서 흘러든 피난민과 이주민들의 사연이 녹아든 곳이다.
대다수 주민이 60대 이상 노인이다.
1930년대 만석동 앞 갯벌을 메운 자리에 동양 방적과 조선 기계제작소(현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서면서 부두건설 노동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겪으며 주민 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으로 유명해진 이 마을이 조성된 지 70여 년.
이곳에도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등 변화의 물결이 일었지만 아직도 쪽방촌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에 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철거주택 주민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했어도 아직 300명가량은 2∼3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이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화장실도 딸리지 않은 말 그대로 '쪽방'이다.
마을 내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은 당연히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에게 여름은 가장 피하고 싶은 계절이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은 쪽방은 바람도 잘 들지 않아 '찜통'이나 다름없다.
이날 찾은 마을 골목은 양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다랬다.
집집마다 얇은 발만 친 채 문을 활짝 열어뒀다.
문가에서 찬 수돗물을 다리에 끼얹던 한모(66) 할아버지는 비좁은 부엌이 딸린 단칸방에서 더위를 쫓느라 바빴다.
스무 살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할아버지는 쪽방에서 더운 여름을 나는 게 46년째라고 했다.
빛바랜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헥헥' 돌아가는 방바닥에 앉자 금세 습기가 올라왔다.
좁은 방 한편에 가스버너 1대를 두고 라면이며 밥을 해 먹어야 하는 탓에 환기도 잘 안 된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방안에만 들어 앉아있으면 되니까 여름이 겨울보다는 낫다"며 선풍기 앞에 바짝 붙어 앉았다.
집안에 누워 연신 부채질을 하던 60대 할머니는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였다.
선풍기를 내내 틀어놓으니 모터 부분이 뜨거워져 껐다고 했다.
할머니는 "혹시 불이라도 날까 봐 무서워서 선풍기를 껐다"며 방안에서 부채를 슬슬 부쳤다.
이날 폭염을 피해 쪽방촌상담소나 경로당에 있는 무더위 쉼터를 찾는 주민도 있었다.
몇몇 주민은 쉼터에서 문구용 볼펜을 만드는 등 소일거리를 손에 잡았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동구와 쪽방촌상담소도 집마다 방문 진료를 하거나 얼음물을 배달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쪽방촌상담소 관계자는 "시원한 쉼터가 마을 곳곳에 있어도 집이 더 편하다며 나오지 않는 주민분들이 많다"며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무더위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괭이부리말' 쪽방촌의 폭염…불날까 봐 선풍기도 못 틀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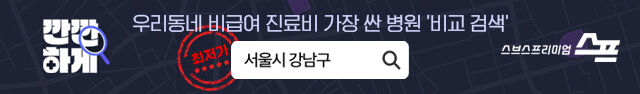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