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교회가 베이비박스 대신 '베이비룸'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소개하는 목적의 기사였다. 목사님은 물건 담는 '박스'가 주는 어감도 싫거니와 야외에 설치된 답답한 공간에 뉘어져 단 몇 분, 몇 시간이라도 방치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여름, 겨울이 특히 문제라고 한다)아기들의 안전 문제도 이유라고 하셨다.
무엇보다, 베이비룸은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마지막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 아기자기한 용품이 진열된 침대에 아기를 눕히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키우게 된다면'을 가정하고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본능-부성, 모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논리다. 유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생명과 안전이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교회의 입장과 그 자체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논리 가운데 온전히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평소 아기들을 예뻐하고 좋아하는 터라 교회로 가는 길부터 (솔직히) 취재는 뒷전이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 어디 있는지 물어 손을 씻었다. 신생아들이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자 특유의 분유와 로션 냄새가 났다. 보육사 품에 안겨, 있는 힘껏 볼이 움푹 팰 정도로 쪽쪽 젖병을 빠는 아기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다.
오동통한 팔과 다리, 뽀얀 피부, 발그레한 볼이 귀엽고 또 애처로워 '와락' 안지 않고 못 배길 것 같았다. 항문 없이 태어나 주머니를 차고 있는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들어올려 보듬었는데 부드러운 살결과 체온이 피부로 전해졌다. 잠이 오는지 아기가 계속 품으로 파고 들었고, 그 느낌이 너무 달콤해서 베이비박스와 교회에 대해 설명하시는 보육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들어가서 기사 쓰려면 그러면 안됐는데) 다른 세상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리포트가 방송에 나가던 날, 고향에 다녀왔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의 시골에 살고 계신다. 고향집에 가면 왜 그렇게 긴장이 풀어지는지 밀린 잠을 몰아 잤다. 딸 온다는 소식에 1박 2일 일정을 빼곡히 채워 준비해 둔 아빠는 이럴 거면 다음엔 길게 다녀가라고 한 소리 하셨다.
엄마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어를 구워 식탁에 내놓았다. 나이 서른 먹은 딸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엄청난 광경인 양 마주앉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보답으로, 비린내 나서 평소엔 먹지도 않는 걸 한 접시를 다 비웠다.
대학 때 소설 '엄마를 부탁해' 첫 페이지, 첫 문장을 읽고 KO당해 엉엉 소리내 울었던 기억이 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째다'라는 문장이었는데, 독자를 손쉽게 울리는 비겁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눈물 콧물 빼며 우는 그 바쁜 와중에 화가 치밀어 씩씩댔다.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급소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어 '젠장, 이 문장은 반칙이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 어떤 소문난 효자, 효녀가 아니고서야(내 생각엔 그 효자, 효녀도 예외일 수 없다) 이 문장 앞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잔인한 상상인데, 만약 '아기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다면, 그리고 첫 문장이 '딸(혹은 아들)을 잃어버린 지 일주일 째다'로 시작된다면, 그건 어떨까? 어느 쪽이 더 슬플까. 내 어머니를 잃는 것과 아기를 잃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견딜 수 없는 슬픔일까.
나로선 아직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선 추가로 하나의 상상이 더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뜨거운 감정을 동반할까, 또, 그것과 이별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고통이 필요할까.
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 방송에 나가선 안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아기의 엄마가 TV를 보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기를 안는다는 행동이 가짜처럼 보일 것 같았다. 뭔가 척하는 행동인 것 같았다.
세상이 비정하다며 손가락질한 어떤 이름모를 엄마가 취재 때문에 잠시 들른 기자도 귀엽다며 넋 놓고 안았던 그 아기를 주변에 보는 사람 없는지 두리번거리다 몰래 떼어놓고 뒤돌아서야 했던, 베이비박스 앞에서 느꼈을 그 때 그 심정은 비참하고 안됐다. 두둔하려는 건 아니다.
분명 어떤 식으로든 100% 합리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 맞다. 그런데도 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것들은 세상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깊이의 슬픔일 테고 베이비박스의 타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과는 다른 영역에서 이야기돼야 할 성격의 것이라서 만약 누군가 그 엄마의 사연을 우연히 알게 됐다면 비난의 말은 잠시 미뤄두고 우선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 버려지는 아기 막는다…'베이비룸' 효과 있을까?
▶ [자막뉴스] 버려지는 아기 막자…'베이비룸' 효과 얼마나?
▶ [카드뉴스] 아기를 놓고 가기 전…한 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취재파일] "아기를 부탁해" 그리고, 엄마도 부탁합니다](https://img.sbs.co.kr/newimg/news/20150728/200855349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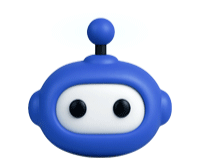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