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상당수 독자는 최근 이응준 작가의 기고문을 통해 표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이 문제는 앞서 취재파일 1편에서 썼듯이 15년 전에 불거졌다. 당시 정문순 평론가 외에도 여러 평론가와 작가들이 신경숙 소설가의 작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묻혔다. 무려 15년 동안.
"표절 지적을 구태여 내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선 셈인데, 이번에 이응준 씨가 터뜨렸더라고요. 당시 분위기는 그냥 쉬쉬했죠. 한창 잘나가는 작가를 꺾으면 되냐, 거론하지 말자는 분위기였죠. 신경숙 씨는 더군다나 주요 출판사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 작가 A 씨.
당시의 분위기를, 신원을 밝히길 꺼린 한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 안에는 표절 논란이 왜 문학인들 사이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고, 긴 시간 묵살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담겨 있다.

● 문학출판의 구조 & 문학권력
우리가 읽었던 신경숙 씨의 책을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보자. '풍금이 있던 자리'와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등은 문학과지성사, '깊은 슬픔'과 '외딴방', '리진' 등은 문학동네, 이번에 문제가 된 '감자 먹는 사람들'과 '엄마를 부탁해'는 창비. 신 작가의 책은 세 출판사에서 골고루 출판됐다. 이 세 출판사는 문학출판의 '빅3'로 통한다. 매출은 문학동네 > 창비 > 문학과지성사 순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각 출판사마다 '수상 제도' 가 있어 (문학상, 신인상 등)작가를 발굴하고, 독자적으로 문예지를 펴낸다. (계간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평론가 이명원 씨는 이 세 출판사에 대해, 80년대까지는 진영논리가 완강해서, 각 출판사만의 색깔을 지켰지만 90년대 이후 스타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2천년대 들어서는 "이해관계의 동맹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인기가 있는, 혹은 인기가 있을 듯한 작가가 눈에 띄면, 이들 출판사가 자사 문예지를 통해 한껏 띄워 왔다는 설명이다. 당장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진 않았지만, 미리 해당 작가에게 의미를 잔뜩 부여하는 평론을 실어 추켜세우고, 이어서 그 작가의 책을 출판하는 반복적인 구도가 고착화돼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경숙 소설가이고, 이 구도를 통해 신 씨는 대중성도 있고, 작품성도 높이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론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의문이 든다. 평론가가 한 둘이 아닌데, 왜 쓴소리를 못하는 걸까. 평론가 김명인 씨는 '평론'이라는 업의 구조를 강조한다. 평론가들은 신춘문예 평론 부문이나 앞서 말한 빅3 출판사의 문학상을 통해 등단한다. 그런데 평론가가 원고를 써서 먹고 살려면 (대학 교수처럼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문예지의 청탁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주요 문예지'란 결국 '빅3 출판사'가 펴내는 문예지다. 문예지가 돈이 될만큼 팔리는 책이 아니다보니, 대형 출판사가 아니면 독립적인 문예지를 운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론가들도 대체로 어떤 식으로든 빅3 출판사와 연결돼 있는 셈이고, 그 출판사의 주력 작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은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어떤 출판사가 새 소설을 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해설을 비평가한테 청탁을 하는데, 비평가가 해설에다가 그 작품을 비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또 설령 비판을 한다 해도,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 게재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비평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그런 비평가들은 대체로 빅3 출판사의 편집위원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비판적 비평이 불가능하겠죠. 결국 특정 작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봉쇄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학을 질식시키는 기본 구조입니다." – 김명인 평론가

이제 15년 전 표절 지적이 왜 묵살됐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테다. '잘 팔리는 작가'의 흠을 굳이 들춰낼,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출판사엔 없었고, 빅3의 눈 밖에 나는 주장은 '조용히'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창비'만이 아니라 '문학동네' 등에도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15년 동안 상처가 곪도록 방치해 병을 키운 책임은 작가와 출판사 평단에 모두 있으므로. 이 공고한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 한, 표절이든 무엇이든, 문제는 또 묻히고, 언젠가 더 심각하게 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문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금 변화의 앞에 나선 건 용기있는 작가와 평론가들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묻히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는 건 우리 '독자'의 몫이다. 작가의 책 한 권 한권을 사고 읽은 건,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준 건 '독자'들이니까. 대중의 금세 잊어버리기를 기대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 또 묻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이 건망증 환자가 아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취재파일]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 정리①…뚜렷한 의혹과 모호한 해명
▶ "절필은 못 해"…신경숙의 '묘한' 입장 표명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신경숙 해명 보니 되레 피해자 코스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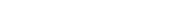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취재파일]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 정리②…15년간의 '묵살'과 '문학권력'](http://img.sbs.co.kr/newimg/news/20150626/200847090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