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가 언어로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은 결국 우리 사회 일반인과 청각장애인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는 지난 14일 천막이 하나 생겼다.
바로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천막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2명의 청각장애인이 번갈아가며 천막을 지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법의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화언어법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2011년부터 수화언어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여러 건의 법률안이 올라왔지만 세월호 사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1일 농성장을 지키던 청각장애인 장민영(32·여)씨는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토로하며 수화언어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은 대피방송을 말로만 한다"며 "그런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이 많으면 역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제때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수화언어법이 제정되지 않아 가장 불편한 것이 교육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사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도 수화를 교사가 아닌 선배에게 배웠다"고 전했다.
장씨와 함께 농성장을 지키던 신모(32·여)씨는 "수화를 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별로 없어 입 모양을 보고 이해해야 하니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항상 힘들고 일반인보다 느리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며 "외국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한국말을 배우며 교육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수화 언어가 표준어가 돼 있지 않아 지방별로 말이 다르다"며 "특히 전문 용어는 수화로 전부 표현할 수가 없어 한 글자씩 풀어 말해야 한다"며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배움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씨와 신씨는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수화가 언어로 인정받게 되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써 일반인과 청각장애인 간 소통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화언어법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일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겨울 다가오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천막을 친 이유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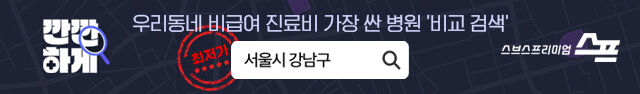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