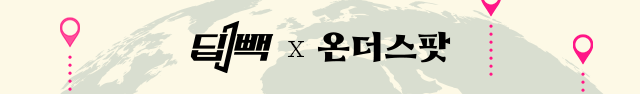MBS(주택담보부증권)이란?
美 JP모건의 사상최대 벌금은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법과 함께 진행해 온 2008년 금융위기 '책임묻기'과정의 일부이다. 최근 한국의 동양증권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회사채)과 기업어음(CP)이 문제가 되고있지만 JP모건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상환권리를 채권으로 바꾼 MBS(주택담보부증권)이 문제가 됐다.
2000년대 초 미국의 부동산열기 속에 은행들은 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바꿔 발행했는데 이것이 MBS이다. 쉽게 말해 대출자에게 앞으로 상환받을 돈을 어음처럼 증권으로 바꿔 판매한 것이다. 은행입장에선 대출해준 돈을 만기 전에 빠르게 자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에도 수년 전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에 이 상품을 들여놓은 것은 다름아닌 외국계 은행들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대출자들이 자신들의 부채상환 의무가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채권자로 넘어가는 것에 반발하면서 크게 확산되지 않았었다.)
JP모건 등 미국 은행들은 이 채권들을 미국의 국책금융기관인 <패니메이><프레디맥>에 팔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 혹은 투자금융공사의 성격을 띤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다. 미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자금대출 지원의 기능이었다. 미국 은행들은 이 두 회사의 보증을 받아 MBS를 일반투자자에게 팔기도 했다.
투자은행들의 탐욕, 풍선처럼 부풀려진 채권가치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들은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다. MBS의 가치(가격)를 높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1) 소득수준이 낮아 갚을 능력이 부족한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2) 대출할 때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격을 올려잡거나, (3) 예상되는 연체율(부실가능성)을 낮춰잡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MBS는 실제보다 신용도가 부풀려졌다. 이런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MBS가 대출자 각각의 대출에 연계해 하나하나 별도의 채권을 만드는게 아니라 대출액을 큰 덩어리로 합쳐 '채권 풀(pool)'이라 불리는 종자자금을 만들어 여기에 기반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별다른 죄책감없이 이뤄진 듯 하다.
결국 부동산거품이 붕괴되자, MBS는 곧바로 부실채권이 됐다. 정부 금융기관인 <패니메이> <프레디맥>은 떠안은 부실채권과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증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330억 달러라니 상상하기 힘든 액수이다. 이 두 기관의 감독기관이 바로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이다. 이번 벌금사태는 막대한 피해를 본 당사자인 FHFA가 JP모건에 대해 2011년 이 피해에 대한 소송을 낸 결과이다.

법무부와 합의한 130억 달러 가운데 (1) '징벌적 벌금'이 50억 달러, (2) FHFA의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40억달러, (3) 주택압류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피해고객에 대한 구제금융지원기금이 40억달러이다. 형사상 책임에 대한 검찰기소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JP모건의 전설적인 CEO, 다이먼은 거액의 합의금으로 아예 검찰의 기소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HFA의 소송에서 다른 피고인 뱅크오프아메리카의 벌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시 같은 MBS 부실판매에 대해 FHFA가 소송을 낸 사안인데, FHFA는 60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모기지부실과 관련한 미국금융사들의 피소와 배상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미 증권위원회(SEC),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에도 JP모건과 씨티 등 5개 은행이 미국 49개 주검찰과 법무부의 소송에서 250억달러 (26조 5천억원)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당시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110억달러로 가장 많은 벌금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JP모건이 이 기록을 깨면서 사상최대 벌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JP모건 건은 이들 다양한 소송 가운데 하나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소송의 결과로 FHFA는 다른 17개 은행.금융사와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 '책임묻기'는 그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월가는 모든 힘을 동원해 오바마를 견제해왔다. '오바마의 월가 때리기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가 추진했던 금융개혁법에서 그 핵심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무력화될 정도로 월가의 로비력과 정치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재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투자를 잘못한 것과 고객을 속인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JP모건이 천문학적 합의배상금에 합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규제 자체보다는 법적인 소송으로 월가의 터줏대감들을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전했다. "그동안 대형금융사에 단호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온 오바마 행정부가 월가 책임묻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월가가 워싱턴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의심했던 대중들을 일부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월드리포트] 계속되는 '월가 손보기'…JP모건은 왜 고개를 떨궜나?](http://img.sbs.co.kr/newimg/news/20130123/200638494_12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