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주말이면 집을 나선다. 젊었을 땐 그래도 마누라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진해서 나갔던 것인데 지금은 눈총이 무서워 자리를 피한다. 사실상 쫓겨나는 셈이다. 우리 집 거실은 아내의 전용공간이다. 결혼 후 줄곧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기 공간으로 침입하더란다. 그리고는 뒹굴거리는데 그 꼴이 가관이란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한동안은 외출을 했다. 그 덕에 평화는 유지됐다. 물론 오래가진 못했다. 어느 휴일 낮, 거실 소파에서 자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가 된통 당했다. 소싯적엔 그런 경우 없는 일을 당하면 시쳇말로 '뚜껑'이 열려 소리라도 질렀는데, 이젠 기세에 눌려 대꾸도 잘 못한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질 땐 눈물이 핑 돌기까지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다가온 것이 자전거였다. 방송인 김창완씨는 자전거를 두고 "너는 든든한 친구, 나의 반려 기계"라고 표현했는데, 그 심정 충분히 알 것 같다. 아인슈타인, 케네디 대통령, 소설가 코난 도일 등도 나처럼 '구박'을 받았는 지 한결같이 자전거 애호가들이었다. 그들의 자전거 예찬은 끝이 없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존 F. 케네디), "자전거를 사라. 살아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아인슈타인), "자전거 타는 단순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마크 트웨인) 등등
![[데스크칼럼] 내가](http://img.sbs.co.kr/newimg/news/20131022/200698199_1280.jpg)
사람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다. 두 바퀴로 균형을 잡아가며 굴러가는 오묘한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직접 페달을 밟으며 느끼는 속도감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요즘같은 청명한 가을, 강둑길의 선선한 바람과 호젓한 숲속길의 정취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난 요즘 그런 자전거를 통해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홀로서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서정윤 시인의 시처럼 말이다.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몸뚱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 그것 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디어야 한다. 부리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 - 서정윤, '홀로서기' 중에서
새는 다른 새의 등에 업혀서 날아가지 않는데 남자는 왜 힘 빠지면 자꾸 업히려 하는걸까? 혼자 놀 줄도 모르고, 사회 생활에서 잠시 주어진 타이틀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기회손실 비용으로 받는 월급을 회사에 공헌해서 받는 것으로 애써 믿으려 하는 바보여서 그런가? 자전거를 타니 확실히 다른 세상이 보인다. 만나는 세상이 다르니 당연히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데스크칼럼]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http://img.sbs.co.kr/newimg/news/20131022/200698200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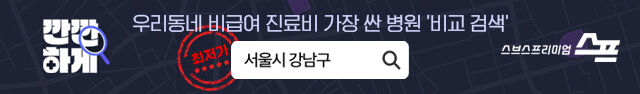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