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감독 조근현, 제작 청어람)의 영화적 가치를 떠나 이 작품은 관객에게 특별한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바로 '진구'라는 배우다.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한번쯤 느꼈을 것이다. '진구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나'라고.
진구는 '26년'에서 5.18과 그 상처로 부모를 잃은 뒤 조폭이 된 '곽진배' 역할을 맡았다. 김갑세(이경영 분)의 제안으로 '그 사람 단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곽진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수의 대상을 향해 돌진한다. 그런 캐릭터를 진구를 몸과 마음으로 품어냈다. 곽진배는 진구의 섬세한 연기를 통해 영화 안에서 가장 뜨거운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다.
강풀 원작 속 곽진배와는 다소 상이한 성격으로 변신했지만, 진구에 의해 재탄생한 곽진배는 그 독립된 캐릭터로서도 매력이 넘친다.

진구와 '26년'의 인연은 가늘지만 질긴 운명의 끈으로 연결돼 있었다. 2008년 이 영화가 '29년'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진구는 '김주안' 역을 맡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제작이 무산되고, 인연이 끊기는 듯 했다. 4년 만에 '26년'이라는 영화로 다시 제작에 들어가면서 진구는 조연 '김주안'이 아닌 주연 '곽진배'를 맡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구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 기다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화가 나를 기다렸다고 봐야한다. 제작이 무산됐다고 마냥 영화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이 드라마와 영화 하고픈 작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화는 이런 나를 기다려줬고, 더 큰 역할까지 줬다. 나에겐 '서프라이즈'한 일이었다"
촬영에 들어가면서 진구는 여느 작품처럼 열정을 다 쏟아냈다. 영화 초반 자신의 신이 집중돼있던 탓에 오랜 시간을 촬영장에서 보내면서 영화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다. 자신의 분량을 앞서 소화했음에도 다른 배우들의 촬영이 이뤄지는 현장까지 지켰다. 그는 "촬영이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 불안해지는 스타일"이라면서 "다른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떻게 영화가 완성되어 가는지를 다 지켜봐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진구의 연기에 있어 외형적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전라도 사투리의 완벽한 구사다. 부모님의 고향이 전라도이긴 하지만 수십 년 전 서울로 올라왔고, 진구는 서울이 고향이기에 사투리는 학습에 의해 습득해야 했다. 다행히도 전작에서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비열한 거리'와 '아이스께끼'라는 영화에 이어 세 번째로 작품 안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썼다. 전작들에서 아주 적은 분량의 사투리만 썼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로 대사를 소화했다. 다행히 영화 출연자 중 한분이 전라도 토박이여서 그분의 레슨을 받았다. 사투리 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었다"

'26년'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진구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관객들이 정치나 이념을 넘어 상업영화의 한편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작품을 제일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영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우리 영화가 어둡고 슬픈 작품인 것은 맞지만, 결국엔 상업영화다. 정치적 의도, 이런 게 있었더라면 나도 작품을 안했을 것이다.
다만,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굉장한 의무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4년 전 이 작품을 하기로 하고 5.18 민주화 항쟁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 그날의 참상을 몰랐다. 그 사실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 나 이 영화 찍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자'라고 생각했다.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누구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영화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영화다"
진구는 '26년'이 공개된 시사회 첫날, 눈물을 훔쳤다. 10여 년간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내 영화에서는 내 역할만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관객으로서 몰입했던 것 같다. 나만 찾다가 큰 그림을 보게 되니 '아 이 영화, 세구나' 싶었다"면서 "나 혼자 찍을 때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한혜진이 나를 크게 만들고, 이경영 선배님이 나를 크게 만들더라. 그 엄청난 시너지에 압도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 진구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뚜렷했다. 2003년 드라마 '올인'에서 이병헌 아역을 맡으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지만, 이후 작품들을 통해서는 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그는 그 당시를 슬럼프였다고 말했다.
"데뷔작 '올인'에 단 2회밖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 그리곤 슬럼프를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거품 맞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슬럼프를 빨리 겪길 잘한 것 같다. 그것도 복이다"
폭발적인 관심과 무관심을 모두 다 겪은 진구는 배우로 한층 견고해질 수 있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순간을 즐기는 법,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확실히 터득하게 됐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늘 내일이 기다려지고. 지금까지 편하게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편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어딘가 가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채워지더라. 욕심의 그릇을 만들어놓으면 불만이 많은 텐데, 아예 그릇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다"
진구는 내년 1월초부터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회오리 바다'의 촬영에 돌입한다. 인터뷰를 한 다음날부터 바로 무술 연습에 돌입한다는 그는 '26년'의 깊은 여운을 잊고 새로운 캐릭터에 빠질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다.
배우 진구는 이렇게 또 새로운 캐릭터로 변신하기 위해 자신의 그릇은 비워내고 있었다. 그의 빈 그릇이 어떻게 채워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김지혜 기자)
<사진 = 김현철 기자khc21@sbs.co.kr>
![[인터뷰] 진구 "거품 빠지고 오히려 성장했다"](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12/12/05/30000195938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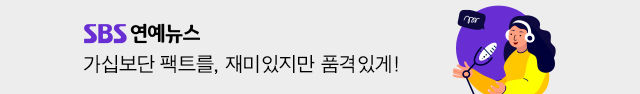


![[단독] "이준석에게 여러 번 소개"…내일 대질조사](http://img.sbs.co.kr/newimg/news/20241120/202009596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