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법무상이 사임하던 날 일본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냈다. 노다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정치 분석기사도 많았지만, 민주당 정권 들어 얼마나 장관이 자주 바뀌는지 통계를 보여준 기사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장관이 자주 교체된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실제 주기를 보니 왜 일본의 장관이 일회용품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알 만할 정도로 일본의 장관들은 ‘툭하면 교체’됐다.
먼저 법무상의 경우만 보면 민주당 정권 들어 벌써 9번째 얼굴이 바뀌었다. 2009년 9월 정권이 출범한 지 37개월이 지났으니, 넉 달에 한 번 꼴로 장관이 바뀐 셈이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노다 총리 집권시기로 범위를 좁히면 주기는 더 빨라진다. 13개월 만에 5번째 교체니까, 석 달도 안 돼 장관이 바뀌었다.
법무상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저출산 담당상 자리는 법무상보다 한 명 더 많은 10명이 역임했다. 소비자담당상도 9명, 납치문제담당상도 8명이 자리를 거쳐 갔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각료 이름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나카 마키고 현 문부과학상이 “일본에서 가장 빠른 것은 신칸센이 아니라 각료 교체”라고 비꼰 말이 수긍이 될 정도의 빠른 교체주기다.
그러다보니 중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장관을 한 번씩은 했다. 총리까지 포함해 각료 경험자가 69명이나 된다. 민주당의 6선 이상 중진 의원 28명 가운데 23명이 장관을 한 번은 했다고 한다. 무려 82%가 넘는 수치다. ‘장관은 아무나 다 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웬만하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비율이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잦은 장관 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특유의 파벌 정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파벌 또는 그룹들이 배타적으로 패거리를 지어 움직이고 파벌의 논리로 움직이다 보니, 장관이라는 자리도 파벌들의 파워게임의 결과로 나눠먹는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밀실에서 담합해 파벌을 배려(?)해 장관 자리를 나누다보니, 탈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다보니 당연히 장관의 자질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힘 있는 파벌에 속하고 정치 경험이 많다는 것이 깨끗하고 능력 있다는 말과 같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설령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부처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처 관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관료사회 아닌가!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을 두고 일본 정치가 여전히 수십 년 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의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세상은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자기들끼리 권력싸움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세상의 흐름에 둔감해지고 동떨어진 채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 없어 뒷전이고, 국제 정세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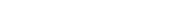
![[취재파일] 日 "웬만하면 장관한다?"…파벌정치의 그늘](http://img.sbs.co.kr/newimg/news/20121025/200611429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