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이 지휘관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고열을 호소하는 훈련병에게 해열제만 처방했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 군의 허술한 신병 및 의료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군인권센터가 입수해 공개한 육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숨진 강원 철원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신모(22) 훈련병은 행군을 8시간 앞둔 26일 정오께 소대장에게 속이 안 좋고 숨이 가쁘다며 군장 무게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소대장은 '군의관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신 훈련병을 의무대로 보냈지만 군의관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군장을 갖추고 그날 오후 8시10분께 32㎞의 행군에 들어간 신 훈련병은 1시간도 안 돼 어지럼증을 호소, 분대장이 군장을 들어줬지만 이내 쓰러져 구급차에서 군의관에게 체온 측정과 폐 청진을 받고는 곧 대열에 합류했다가 얼마 안 돼 다시 구급차 신세를 졌다.
행군을 지휘 감독하던 이 부대 대대장은 2차 휴식 장소에서 '환자가 너무 많다'며 신 훈련병 등에게 행군에 합류할 것을 명령했다.
신 훈련병은 오후 10시50분께 다시 낙오했지만 동료의 부축을 받아 3차 휴식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고, 휴식 후 재차 낙오해 구급차를 탔다.
행군이 시작 6시간20분이 지난 27일 새벽 2시30분.
대대장은 신 훈련병 등 구급차에 탑승한 10여명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 다시 행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시 행군을 시작한 신 훈련병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고, 결국 행군을 마치지 못한 채 부대에 조기 복귀했다.
신 훈련병이 부대 막사에서 쓰러진 시간은 오전 4시10분께.
체온이 40도까지 오르자 부대 상사가 군의관에게 상태를 보고했고, 지시대로 수액을 투여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다.
신 훈련병은 이후 대대 의무대에서 사단 의무대, 육군 병원인 경기 포천 일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그날 오후 4시30분께 숨졌다.
사인은 '횡문근융해증' 및 '급성신부전증'.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발전,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지난해에도 육군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고열로 부대 의무실을 찾았다가 당직 군의관이 퇴근한 상태에서 의무병이 해열제만 처방한 뒤 뇌수막염에 의한 패혈증과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숨져 파장이 일었다.
또 같은 해에 이 부대 소속의 훈련병이 중이염을 호소했으나 훈련소 측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규정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환자를 적합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훈련병이 병원을 옮겨다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정말 안타깝다"며 "병사들의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해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신 훈련병을 일병으로 1계급 특진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했다.
이 사고로 해당 부대의 중대장은 경고, 소대장·행정보급관·분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행군 사망 훈련병 '고통호소에도 무시…행군 강행'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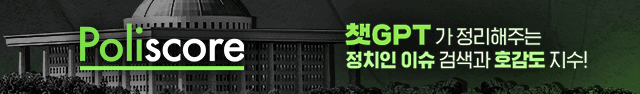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