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약 5분 거리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 모(48) 씨는 오늘(16일) "집회 소음으로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 집에서 창문도 열지 못한다"며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갑갑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매주 토요일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달 11일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이 집회를 포함해 4건의 집회·행진이 신고됐습니다.
신고 인원만 총 1만 1천80명에 달합니다.
삼각지역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10년째 사는 이 모(42) 씨는 일부 단체가 집회할 때 대형 크레인에 스피커를 매다는 바람에 고층에서는 소리가 더 울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집회가 시작된 초반에는 하루에 4∼5번씩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러나 바뀌는 것도 없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강로1가 주민인 초등학생 A(11)양은 "집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 영어학원에서 내주는 녹음 숙제도 할 수가 없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주민들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한강대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돼 발생하는 교통 체증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정 모(29) 씨는 이제는 주말이면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강남에서 친구를 만날 때면 늘 버스를 탔는데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 제시간에 도착하려면 지하철을 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강 모(33) 씨도 "일주일에 3∼4번가량 이용하는 남산도서관에 가려면 삼각지역 인근을 지나야 하는데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져서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삼각지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삼각지 부근 시위로 인해 배차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양해해달라'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하철 삼각지역 이용객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삼각지역에서는 총 72만 6천675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인 지난해 같은 달 46만 8천496명과 비교해 5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다못한 삼각지역 인근 용산대우월드마크와 용산파크자이 주민은 지난해 12월 집회 소음 등과 관련한 탄원서를 각각 395명, 426명의 이름으로 관할 구청·경찰 등에 제출했습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에서도 지난 1월 340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경우 규정상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탄원서가 사본으로 제출돼 개인 민원으로 접수한 뒤 소음 측정 주무 기관인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3일 앞으로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에는 양방향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삼각지역과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이 모(37) 씨는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큰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행진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정 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집시법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12일과 이달 3일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속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3천 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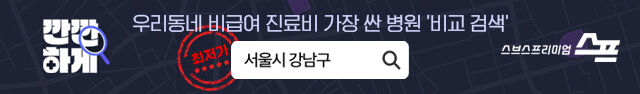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