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생물다양성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자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는 국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민관 포럼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포럼은 8월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고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형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 정의·기준을 마련하고 잠재 후보지를 발굴하는 일도 맡습니다.
애초 재작년 열릴 계획이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개최되는 15차 CBD 당사국총회에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프레임워크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멈추기 위해 세계가 달성할 목표들이 담길 전망입니다.
작년 7월 공개된 프레임워크 공식 초안 첫머리에 제시된 목표는 '보호구역과 OECM을 지구의 30% 이상으로 확대한다'입니다.
한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등재된 한국 보호지역은 육상 1만6천917㎢와 해상 7천979㎢로 우리나라 전체 육상과 해상의 약 17%와 2.5%입니다.
개발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호지역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OECM입니다.
2018년 14차 CBD 당사국총회 등에서 정해진 OECM의 대략적 정의는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생태계 기능·서비스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보호지역과 OECM의 가장 큰 차이는 최우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보호지역은 자연보전이 최우선 목적이어야 하지만 OECM은 자연보전이 최우선 목적이 아니어도 보전에 효과적이면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찰림이나 한 가문이 소유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팔지 않는 땅 등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동식물의 쉼터가 된다는 점에서 OECM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구체적인 정의는 국제사회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호구역을 지구의 30%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CBD 당사국들이 결의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이 목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포럼을 구성하게 됐으며 기본 로드맵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 30%를 자연보호구역으로' 국제 목표 맞춰 국내도 확대 추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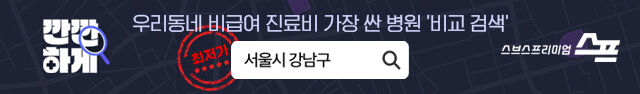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