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를 못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영세민이 34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불황이 큰 이유지만,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그만큼 싸져야하는 기본 원칙이도무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멀기만한 복지국가, 그 실태를 정명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성북구 하월곡동.
계속되는 경제불황은 특히 이곳 주민들에겐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세민들은 최근들어 수입은 눈에 띄게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월곡동 주민들 : 연금도 없는 사람들은 이만원, 삼만원, 만원짜리 (건강보험)가입하라고 해서 들었더니 세상에 8만원, 9만원 나가요. 안 내린데요. 낼 길이 없다는데도 안 내린데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단이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등을 근거로 가입자들의 소득을 추정해 부과합니다.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현장확인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많아 가입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더라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하월곡동 주민: 안 내면 잘난 집으로 차압을 들어온다고, 통장에 돈 한 푼 있으면 몰수해 버리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위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34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가가 보장해 줘야할 최소한의 헌법상 기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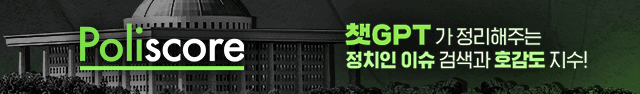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