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전 발전소 굴뚝에 올라 오염물질을 측정하던 작업자가 작업에 사용된 드론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이런 위험을 무릅쓴 채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검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굴뚝에 오르지 않고도 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는 지금 높이 80m짜리 굴뚝의 중간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장 굴뚝에서 어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화하는 이 공장에선 대기오염 물질 10여 종을 내뿜는데, 배출량 측정 장비를 깔아봤더니 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두세 명의 작업자가 나눠 들고 좁은 굴뚝 난간을 오르는데 이내 녹초가 됩니다.
여름철엔 굴뚝 열기까지 더해져 극한의 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고, 강한 돌풍이 불 땐 온몸이 휘청거립니다.
[유정웅/환경과학원 전문위원 :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굴뚝 자체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고요.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달 전엔 전북 전주의 한 발전소 굴뚝 측정에 나섰던 작업자가 측정 장비를 올려 주던 드론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오르지 않아도 되는 자동측정장치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측정 가능 항목이 적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6만 곳 가운데 설치된 곳은 1.6%뿐입니다.
이 때문에 8년 전부터 환경과학원이 대체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굴뚝 벽 측정구에서 추출한 배출가스 시료를 배관을 통해 땅으로 끌어내려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관건은 배관을 통해 내려오는 동안 가스 내 성분 농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건데, 배출검사 물질 45종 중 19종에 대해서 이 기술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이 설비를 이용한 지상 측정도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홍배/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 (민주당) : (지상 시료채취가 25종 물질에 적용될 경우) 연간 굴뚝 직접 측정 횟수가 190만 회에서 93만 건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체들의 측정 방식 변경을 유인해 주긴 하겠지만, 시설 개선에 3~4천만 원이 드는 만큼 영세 사업장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김용우, 영상편집 :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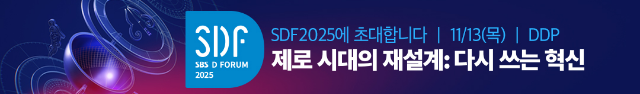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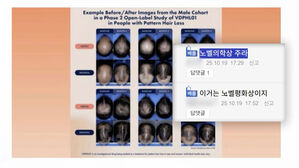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