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성과보수 보상 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영진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성과보수 조정·환수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회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71.2%인 109개사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최소 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존속 기간이 이연 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 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고,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 사유와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도 지난해 기준 9천억 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 성과와 과도한 위험 추구와 위법 행위 등이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만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찬성률이 98%에 달하는 등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통제가 의무시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금감원 "성과보수 잘못된 결정은 책임 물을 것"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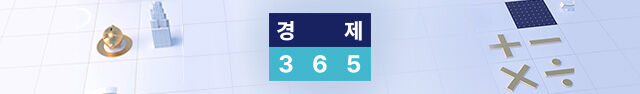


![[단독] 윤, 건강 상태 어떻길래…"망연자실, 출석 의지 없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50712/202090741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