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시 불거졌다.
불씨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며 분도론을 제기했다.
손 전 대표는 "도지사를 할 때도 분도 얘기가 있었으나 그때는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반대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부지역의 인구가 330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다음으로 많고 파주 LCD단지 등 인프라를 갖춰 광역단체로 독립돼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은 이미 독립했고 경찰도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다.
1991년에는 국회 내무위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분도 문제를 제기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이듬해인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삼기까지 했다.
제16대 대선을 한달 앞둔 2002년 11월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총선을 1년 앞둔 이듬해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어 제17대 대선 1년 전인 2006년에도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경기북부 5개 시민단체가 '경기북도 신설 운동 연합회'를 발족, 분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지방선거가 열린 2010년에는 경기북부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것은 무엇보다 경기북부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까지 받아야했다.
서울을 사이에 두고 있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는 지역 정서가 다르다는 요인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인구와 면적이 광역단체로서 면모를 갖췄지만 사실상 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도 제2청사의 기능이 제한돼 북부의 독자적인 개발 정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도론의 배경이 됐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는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에 해당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333만1천747명으로, 서울(993만616명), 경기남부(21개 시·군 938만5천33명), 부산(349만8천529명), 경남(337만3천871명) 다음으로 많다.
특히 경기북부 인구는 1990년 134만 명, 2000년 234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올해 333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19대가 될 올해 대선을 앞두고 후보군 가운데 현재까지 경기도 분도론을 공식 제기한 인물은 손학규 전 지사 한명이다.
지난 30년간 선거 때마다 불거진 분도론이 이번 대선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대선 단골메뉴 '경기 분도론' 다시 수면 위로
87년 대선 때부터 30년간 각종 선거서 '이슈'…정치적 합의 '불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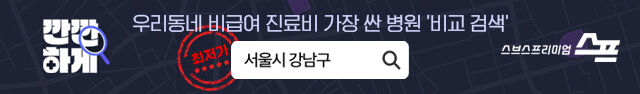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