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들이 흥겹다.
"누군가가 묻는다, 여행이란 왜 하는 것이냐고. 언제나 어떤 완전한 힘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여러 가지 감성들을 일깨우는데 필요한 자극제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다." - 장 그레니에, <섬>
● 여행을 하는 이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고 부추기는 세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상을 전파하기에 바쁜 매스 미디어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그들은 협박까지 한다. 너희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줄 아느냐면서...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너는 이 정도도 가지지 못한 삶이지 않느냐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조장하고, 나아가 수치심을 유발시키면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그러니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협박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린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특이한 것, 더, 더, 더....를 외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 혼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더 좋은 먹거리, 더 나은 몸과 건강,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과도한 소비만이 해결책이라고 외치는 듯한 매스 미디어 앞에서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데,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라는데, 그것이 만족이라는데, 그래야 행복하다던데...

아마도 아닐 것이다. 천박한 자본주의는 만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것들'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유혹은 너무도 치밀하고, 또 교활하다. '필요'가 아닌 '과시'를 주장하는 그들의 감언이설은 '과시가 곧 필요'가 되는 마법을 너무도 쉽게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게 계속되는 욕망 앞에서 만족이 있을 리가 없다.

무력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잘 속기도 하면서 부평초처럼 삶이라는 물 위에서 부유하는 인간, 그것이 우리의 진면목이기 때문이다. 어쩌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도리도 없지 않는가.

그것이 아마도 장 그레니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여행은 아마도 일상 속에서도, 길 위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백화산 둘레길을 걸었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천년 옛길>이라고 하고, 경북 상주에서는 <호국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로 그 길이다. 백화산 둘레길은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의 경계에 있는 백화산(933m)을 중심으로 상주 옥동서원에서 영동의 고찰인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은 속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금강으로 흘러드는 구수천(龜水川)의 여덟 개 여울(八灘,8탄)을 따라 흐른다. 길의 거리는 6.6km 남짓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산보하듯 걸을 수 있는 호젓한 둘레길이다.
(*구수천(龜水川)은 석천(石川)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구수천을 품은 계곡이 석천계곡이다.)


백옥정에서 바라보는 구수천은 수봉리의 정자마을을 안고 돌아나간다. 백옥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정자마을이다. 구수천의 물길 너머로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이었을 들판이 아스라하게 펼쳐져 있다.
그 순간 눈에 띄는, 구수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사람들이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넌다. 나이를 잊은(?) 그들이 즐거운 듯 징검다리를 깡충거리며 왔다 갔다 한다. 여러 번을 반복해서 오고가는 그들의 얼굴에서 동심의 순간이 보이고,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작은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혹여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 흐르는 강물에 가차 없이 던져 버릴 일이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가로놓인 애증에 대해 애도(哀悼)와 타협(妥協)이라는 조화 속에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소환한 추억에 징검다리를 깡충깡충 건너는 그들도,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들도 즐거운 것이다.

천년 옛길이라는 이름이 그저 지은 이름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길은 오랜 세월을 살아 왔음을 증명하는 껑충 자란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아득히 이어진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림들이 이 길을 걸어 마을과 마을을 오고 갔을 것인가. 그들이 흩뿌려놓은 삶의 향내를 오롯이 맡을 수야 없겠지만 길이 품고 있는 깊고 오래된 정취만큼은 가슴으로 느껴져 온다.


이 길이 <천년 옛길>이면서 <호국의 길>인 이유는 백화산 정상부에 위치한 금돌산성(今突山城)이 갖는 역사성 때문이다.
금돌산성은 총길이가 약 7km에 달하는 석성(石城)으로, 낙동강과 금강을 양 편으로 거느린 지역적 특수성과 높고 험한 산세에 덕분에 백제와 끊임없이 대치하던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특히 성곽 내부에 존재하는 대궐 터는 서기 660년, 태종무열왕이 황산벌에서 백제와의 마지막 일전을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김유신을 배웅하던 지휘소였다고 한다. 그래서 <천년 옛길>이다.
또한 이 금돌산성은 1254년 10월,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당시 상주 백성들이 황령사 승려인 홍지(洪之)의 지휘 아래 자랄타이(車羅大)가 이끄는 몽고군을 크게 물리친 곳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저승골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몽고군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게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도 수많은 상주지역의 의병들이 은신처로 삼아 활약한 곳이 바로 이곳 백화산이었다니, 역시 <호국의 길>인 것이다.

빛살이 내려앉아 그윽하고 아늑하던 구수천에 잔바람이 불면, 빛살은 튕기듯 흩어지고 이내 모여든 빛살은 윤슬이 되어 물 위에서 일렁이고 또 아롱댄다.


길은 구수천을 사이에 두고 오솔길과 덱으로 나뉘어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어느 한편의 길을 선택한 이에게 다른 길은 언감생심이다. 비록 얕은 개천이라고는 하나 그 개천을 건너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건널 다리가 없었다.
구수천 3탄(灘, 여울)에 이르자, 그제야 징검다리가 나타난다. 도보여행자들은 징검다리에 대한 감흥이 다 했음인지 조금 더 큰 징검다리를 보고도 처음처럼 요란스럽지가 않다. 그래도 감흥이 두터운 누군가는 답사대장의 불호령을 듣고서야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그래도 아쉬운 양 질긴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운 법. 그래도 헤어질 수 있어야 새로운 인연과의 상봉도 가능한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진 말지니... 길 위에서의 회자별리야 다반사가 아니던가.

머무를 수 있을 때 머무는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면 벌써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한 발 한 발 제대로 느끼며, 나와 우리의 사는 모습을 천천히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주마간산(走馬看山)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덕목 중 으뜸이 아니던가.


아마도 여기 어디쯤에 회양목이 군락지를 이루며 자라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은 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았고, 게다가 눈이 까막눈인지라 회양목 군락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쳐왔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길은 가도 가도 물길을 벗어나질 못한다. 그래서일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길을 닮은 길도 완만하고 여유롭다. 물길마냥 서두를 일도 없다. 길 폭도 넉넉한지라 동무라도 있는 여행자라면 도란도란 이야기도 풍성할 것이다.


구수천 4탄 지점에 이르자 출렁다리가 행인을 맞는다. 구수천이 계곡을 흐르는 물길인지라 건기와 우기의 수량 차가 큰 까닭에 출렁다리는 생각 외로 높고 길다.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구수천은 산과 산 사이를 가르며 아득히 흘러가는 침입자의 모습이다.
백두대간 봉황산(741m) 자락에서 발원한 이 물은 흘러 경북 상주시 화서면, 화동면, 모동면을 거쳐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에 이르러 초강천(송천)과 합류한다. 이어 초강천은 영동군 심천면에서 금강과 몸을 섞는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때에는 바다로 흘러 더 너른 세상과 만나 구수천에서 옛일을 그리워할 것이다.


아서라! 더 이상 욕심낼 일은 아닐 것이다. 그저 길이 허락하는 만큼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봄바람에 일렁이는 오후의 나른한 봄 햇살과 어깨 걸고 동무삼아 무아(無我)의 지경을 느껴보는 것만도 좋을 것이다.
산에 오면 산이 되고, 물에 오면 물이 되는 것이 무아다. 굳이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상대와 상황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아가 아니던가. 풍경과 가만히 어우러지면 될 것이다. 이리도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을 어디에서 또 만난단 말인가.
<2편에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발지인 옥동서원을 가는 것은 어렵다. 열차를 이용한 뒤 황간역에서 택시를 타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옥동서원이나 반야사에 주차를 하면 된다.
![[라이프] 천년 옛길을 걷다 - 백화산 둘레길 ①](https://img.sbs.co.kr/newimg/news/20190410/201301405_1280.jpg)



![[단독] 종편 채널 간부가…"식사 중 옷에 손 넣어" 충격](http://img.sbs.co.kr/newimg/news/20260127/20215120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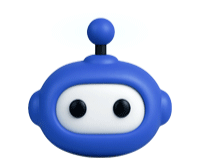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