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과 인권단체가 의료거부와 고용차별, 부당 해직 등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을 없애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계 에이즈의 날'인 12월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최초의 감염인이 보고된 지 30년이 지났고 2015년 기준 1만명 이상 감염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차별과 낙인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에이즈 환자의 신장 투석 치료를 거부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의경을 경찰병원으로 강제 후송한 뒤 동료 전원에게 HIV 검사를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명백히 공포와 낙인에 기반한 비과학적이고 위법적인 대응"이라고 성토했다.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약을 먹고 진료만 제대로 받으면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고 보통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는데도 감염인들은 낙인과 공포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감염인이 차별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에이즈 환자가 되고 이어 신규 감염인이 양산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인 당사자인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대표는 "아픈 사람이니 치료를 더 잘 받아야 하는데 진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나,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못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라며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 차별과 고용차별을 비판했다.
윤 대표는 "한국의 에이즈 예방은 아직도 콘돔을 나눠주는 것 정도가 전부"라며 "국제 사회에서 효과도 없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도 안 된다고 평가받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에이즈의 날' 앞두고 감염인·인권단체 "차별 사라져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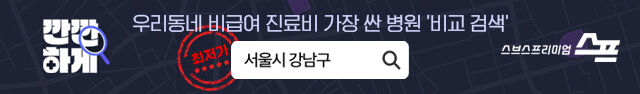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