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한해 2천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홀로서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대 A 씨는 아동양육시설을 떠난 지 5년이 채 안 됐습니다.
광역시도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에 애쓰는 청년들을 첫 5년 동안 돕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 지원기관과의 상담에서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달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 이 친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막막했었어요.]
생활고 끝에 죽음을 맞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 가구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A 씨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정작 지원기관에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 '(A 씨에게) 이런 과거력이 있다'를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를 보호했던 시설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법적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A 씨 처지를 미리 알았다면, 수시 연락과 자택 방문, 그리고 치료 유도 등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복지시설을 나온 뒤 3년 만에 세상을 등진 B씨도 제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기관에 전달한 연락처가 잘못돼 상담 자체가 1년이나 늦게 이뤄진 것입니다.
A 씨나 B 씨처럼 자립 후 5년 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은 최근 5년 사이 22명이나 됩니다.
그중 10명만 '위기 신호'가 포착됐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주거나 고용에 위기를 겪는 것 같은 경제난이 대표적 '위기 신호'였습니다.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 징후들을 다각화해서 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위기 신호' 파악을 고도화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원기관이 제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상담 땐 "잘 지낸다"더니…홀로서기 나선 청년들의 비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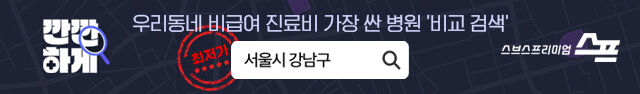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33군사경찰'도 동원"](http://img.sbs.co.kr/newimg/news/20250104/202026055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