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건너가 일하던 시절에 이들을 '손님' 노동자로 불렀던 독일은 이제 외국인들과 동등하게, 또 함께 사는 포용 정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나 시민단체 같은 민간 기구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 사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자>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중등학교, 이제 막 프랑스어 수업이 시작돼서 저는 지금 교실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교사는 시리아 출신 난민입니다.
시리아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다 8년 전 유럽 난민 사태 당시 독일에 온 커코리안 씨의 현재는 한 대학에 전적으로 빚진 겁니다.
[빅토리아 커코리안/시리아 출신 교사 : 이민자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독일어 집중 코스와 교육 세미나, 학교 현장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으로서 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포츠담대학의 이민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들로 퍼져 극심한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방 몇 개짜리 집을 구하고 있습니까?) 2개짜리 집을 구하고 싶어요.]
베를린의 이 시민단체는 취업 주선은 물론 외국인들이 언제든, 어떤 문제든 찾아와 상담하는 곳입니다.
[클라스 크라머/시민단체 '튀뢰프너' 매니저 : 우편물을 받는다거나 무엇인가 신청해야 한다거나 이런 서류 작업들을 (이민자들이)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섞여 산다는 건 어렵고,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후퇴하거나 수정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사회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하기도 했던 독일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운 건 학교와 시민단체 같은 민간 부문이었습니다.
[파하드 알루세인/시리아 출신 노동자 : 독일에 머물면서 가족도 만들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미 인구 8천400만 명 중 4분의 1이 이민자인 독일은 더 개방되고, 더 통합된 사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영택·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최하늘)
▶ CEO급 인재도 한국선 "포기"…독일은 문턱 더 낮춘다 (풀영상)
▶ 서툰 독어로 3년 안돼 영주권…한국선 억대 연봉도 좌절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민 된 손님' 4분의 1이 이민자…통합 사회로 가는 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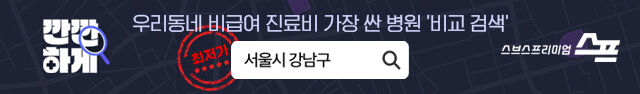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