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15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선 쾰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었다. 후반부 곡목은 리하트르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이었다. 1910년대에 작곡된 곡으로, 서정적 자아의 알프스 등정을 영화음악처럼 그려낸 교향시같은 작품이다.
연주 직전 공연장측에선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마지막에 여운이 남는 곡이니, 박수는 좀 기다렸다가 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요지였다. 이 곡은 알프스의 자연과, 그것을 탐방하는 어느 등반가(이 곡의 서정적 자아가 된다)의 하루를 그린다. 해 뜨기 전의 고요에서 시작해, 극적이었던 하루의 여정을 곱씹어보는 여운의 시간을 갖고, 신비롭고 적막한 알프스의 밤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다. 그러니 청중 여러분도 음악 속 주인공과 함께 여운을 좀 즐겨달라는 당부였던 것이다.
50여분간의 연주는 장쾌하였다. 종결부에 이르러, 연주자들은 가장 여린 소리로 알프스를 뒤덮은 밤의 적막을 묘사했다. 악보에 적힌 음표의 연주는 끝났지만, 음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주자들은 악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고, 지휘자의 손도 허공에 들린 채였다. 이렇게 잠시만이라도 침묵을 음미하는 것은 이 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꼭 클래식음악 애호가가 아니라도 음악에서 ‘침묵’이 갖는 중요성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것이다. “나는 가수다” 등의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침묵이 소리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을 많이 보시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이토록 중요한 침묵은 채 5초도 이어지지 못했다. 객석 어디선가 터져나온 요란한 박수 때문이었다. 지휘자의 표정에 당혹스런 빛이 스쳐갔다. 그 침묵이 박수소리의 칼날에 찢겨나가는 순간,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렇게 가슴 철렁했던 사람이 나 뿐은 아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 * * *
마지막 피날레가 “꽈꽈꽈꽝” 하고 장대하게 끝나는 곡들에선 마지막의 박수가 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조용하게 끝나는 곡에서 발생한다. 그런 곡이 적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나 말러의 교향곡 9번은 작곡가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이며, 내용적으로도 죽음을 다룬다. (곡의 마지막이 곧 죽음의 순간을 상징한다.) 이런 곡은 마지막에 연주자와 청중이 침묵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얼마전 타계한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말러 9번 교향곡 동영상을 보시라. 음표가 끝난 뒤에 남는 적막의 여운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지. 그러한 침묵의 감동을 예비하기 위해, 공연장측은 조명까지 서서히 어둡게 만드는 배려를 한다.
[아바도 지휘 말러 9번 교향곡 실황 영상, 2004년 로마.]
위 링크의 영상에서, 음표의 연주는 1:16:10에서 끝나지만, 로마의 청중은 1분 이상 침묵에 동참하며 감동을 함께 빚어내고 있다. 이런 침묵은, 국내의 뜻있는 음악애호가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것이다. 마음 졸이지 않고 침묵의 순간을 향유하기 위해 이런 곡은 해외에 가서 듣고 싶다고 할 정도이다.

그런데, 마태수난곡 마지막 음표가 연주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누군가 박수를 요란하게 친다면? 이런 성급한 박수를 치는 분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브라보!” 라는 함성까지 같이 외친다면? 내용적으로 이는 “아싸, 잘 죽었다!” 하고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요, 음악적으로는 3시간에 걸친 콘서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고한 음악가들에게, 그리고 연주회장을 메운 수천의 청중들에게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다.
* "안다 박수"라는 이름의 폭력 *
이렇게, 남들이 곡의 여운을 즐길 새를 주지 않고 터져 나오는 박수를 이른바 “안다 박수”라고 부른다. “곡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앞장서서 성급하게 치는 박수”라는 뜻으로 젊은 음악애호가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안다 박수’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실제로는, 잘 몰라서 음악이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유형을 뭉뚱그려 “안다 박수”라 칭하자.
‘안다 박수’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박수란 결국 자기가 좋아서 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음악회 가서 좋다고 느끼면 악장 사이에도 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악보상의 음표 연주가 끝났는데, 그 때 박수 좀 친다고 중죄인 비난하듯 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올바른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안다 박수’는 다른 사람의 엄연한 권리, 남이 연주회의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공공 장소에 있는 사람 각자에겐 투명한 직사각형의 상자가 씌워져 있다. 이 상자는 각 개인에게 부여된 물리적·상징적 공간이다. 남에게 부여된 공간을 신체접촉에 의해서든, 소리로든, 냄새로든 침해하는 것은 실례다.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례합니다.(Excuse me)”라고 말해야 하고, 이미 침해해 버렸다면 “죄송합니다(I’m sorry)”라고 말해야 마땅하다. “안다 박수”는 음악당이라는 공공장소에 모인 청중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상징적 공간의 상자를 소음으로 부수어 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어쩔 수 없이 저질러 버렸다면 다른 청중 모두에게 몹시 미안해 해야 마땅하다. 마치 휴대폰 벨소리를 울려 음악회를 방해한 것과 다르지 않다.

* 끝음의 여운과 침묵도 음악이다.
그렇다면, ‘비자발적인 안다 박수’는 왜 나오는 것일까? 그야, 몰라서 그럴 것이다. 우리네 학교 교육에선 음악회에서 언제 박수를 치고 언제 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재학생들을 상대로 연주회를 열면서 관객으로서의 매너를 가르친다.
박수는 음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치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야구 격언은 연주회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악은 침묵과 여운을 포함한다. 내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도, 지휘자가 손을 든 채이거나,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에 손을 올린 채, 또는 입을 댄 채 그대로 있다면 그건 “아직 박수를 치지 말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그럴 때는 기다려 주시라. 당신의 성급한 박수는 심장이 좋지 않은 어느 청중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간혹, 열심히 연주한 연주자에 대한 예의랄까, 그런 차원에서 얼른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께는 본인의 선의와는 달리 연주자가 언짢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뭐 그리 복잡하냐? 그래서 클래식 연주회 가기 싫다”는 분들도 있다.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해 말씀드린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남들 다 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박수 치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연주회에서 정말 좋은 박수는, 소리의 여운이 공기중에서 사라진 뒤 장작에 불 붙듯 서서히 시작해 오래 오래 활활 타오르는 박수다.
p.s. 그래서 말인데, 공연장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안될까? 휴대폰을 꺼 달라는 사전 안내방송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연중 휴대폰 벨소리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안다 박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처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성급한 박수가 터져나오면 다수 청중의 감상을 망칠 곡의 경우, 곡 마지막 부분에서 프로젝터 영사기를 가동해 “아직 박수치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을 무대 뒷벽에 쏘는 것이다.
![[취재파일]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https://img.sbs.co.kr/newimg/news/20140220/200729737_128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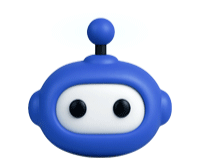
댓글